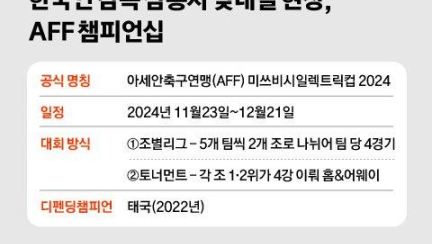윌리엄 그랜트를 이끌고 있는 피터 고든(55·사진) 대표이사는 위스키 사업의 특수성으로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꼽았다. 그는 “맛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법은 철저히 전통을 지키되 경영 위기가 왔을 땐 참신한 아이디어로 돌파한다”고 덧붙였다. 피터 고든이 창업주와 다른 성(姓)을 쓰는 이유는 윌리엄 그랜트의 외손자여서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 5세 경영인 피터 고든 대표이사
-위스키 제조는 거대 산업이 됐다. 사업의 핵심은 생산성 아닌가.
“생산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제품의 가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경영학적으로 다소 비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전통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우리는 증류소 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지 않고 아직도 공장 칠판을 사용한다. 컴퓨터는 정확하지만 판단을 하지는 못한다. 각 제조 과정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맛을 유지하는 데 더 중요하다. 전기 공급이 멈춰 기계 작동이 멈추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 다행히 직원들 대부분이 제품의 전통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수익을 좇지 않는 것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뜻인가.
“맛을 유지하는 게 본업이라는 얘기다. 증류기를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 구리(copper) 전문가들을, 오크통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예 장인들을 채용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엄청난 인건비가 들지만 고유의 맛을 유지한다는 대전제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 글렌피딕은 증류·숙성·병입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유일한 증류소다. 맛을 위해 시설 투자를 감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만 하면 된다면 쉬운 비즈니스 아닌가.
“위기의 순간 창의적 발상과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 예컨대 2010년 1월 스코틀랜드에 내린 폭설로 100여 년간 사용한 숙성창고의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오래된 숙성 창고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일관된 품질의 위스키 원액을 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숙성창고 붕괴로 위스키 원액들이 영하 19도의 겨울 하늘과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품질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손상된 숙성창고 안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맛과 향을 찾아냈다. 우리는 ‘천사의 몫으로 날아간 맛과 향이 폭설이라는 천사의 눈물과 함께 되돌아왔다’며 붕괴 현장에서 살아남은 원액으로 한정판 위스키를 제조했다. 이 제품이 글렌피딕 최초의 무연산(Non-aged)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 스노 피닉스’였다. 유산과 혁신은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세월이 지나고 후손이 늘어날수록 가족 경영이 어렵지 않나.
“25년 전쯤엔 주주가 60~70명가량 됐다. 지분이 너무 잘게 쪼개져 있다는 생각에 대주주와 회사가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사들였다. 현재는 후손 9명이 90%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감독이사회와 가족협의회라는 두 개의 기구가 경영의 핵심이다. 감독이사회는 주요 의사 결정을, 가족협의회는 배당 문제나 다음 세대를 어떻게 고용하고 교육할지를 결정한다.”
-후손들을 위한 계획이 중요한 업무란 얘기인가.
“글렌피딕 50년산은 50년 전 선조들이 후손들을 위해 개봉하지 않고 보존했기 때문에 존재한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로 당장 내 임기 내의 수익보다 후손들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을 더 중시한다.”



![[오늘의 운세] 5월 1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