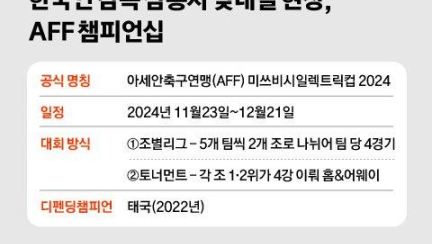나란한 이 두 장의 사진 사이에는 30년 세월이 놓여있다. 1972년 서울 중림동 골목 안에서 인형을 업고 놀던 자매(사진 (左))는 2001년 아들을 업은 엄마와 중년 여성이 돼 어린 시절을 돌아본다. 얼굴 위에 번지는 미소는 시간이 앗아갈 수 없는 두 사람의 자매애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을 찍고 있는 사진가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다.
이들이 믿음을 넘어 친숙함을 드러낸 이는 사진가 김기찬(65)씨다. 1960년대 후반부터 골목 안 풍경을 찍어온 그는 6권째 '골목 안 풍경'사진집(눈빛 펴냄)을 내면서 지난 30여 년 그 골목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불러모았다.
젖먹이는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고, 까까머리 중학생은 다정한 가장이 되어 아내와 함께 포즈를 취했다. 실핏줄처럼 집 사이를 이어주던 골목이 그 인연의 끈이었다.
1백60점 흑백 사진 속에 되살아오는 것은 그들만의 인연이 아니다. 사진은 우리 눈과 동행한다. 좁은 골목 안을 뛰어가는 아이 얼굴에 우리 모습이 겹친다. 재개발에 밀려 사라진 골목은 많은 이들에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골목길의 시대'를 추억하게 만든다.
이미지 비평가 이영준씨는 김씨의 사진이 "도시적 삶의 한 양식으로서의 골목에 대한 다큐멘터리"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 사진기록이 "현재 우리가 골목길이 사라진 그 지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주는 "현재와 닿아있는 어떤 끈을 놓지 않고 있기"에 더 소중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찬씨는 "혹자는 내가 골목에 너무 집착한다고 하지만 골목은 내게 삶을 가르쳐준 '인생의 배움터', 나의 고향이었고 나의 안식처였다"고 말했다. 02-336-2167.
정재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