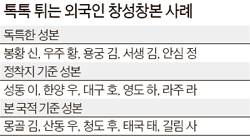
필리핀 국적의 판야스 메리벨아스(40·여)는 2005년 2월 한국 남성과 결혼해 2008년 8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름은 바꾸지 않고 옛날 이름을 그대로 썼다. 하지만 결혼해 낳은 두 아이가 자라 학부모가 되면서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다. 자신의 이름 때문에 아이들이 혼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학내에서 따돌림을 받았다. 결국 메리벨아스는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에 한양(漢陽)을 본(本)으로 하고, 우(禹)를 성(姓)으로 하는 창성창본(創姓創本) 신청 허가서를 냈다. 한 달 뒤 법원으로부터 허가 결정문을 받았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의 창성창본 신청이 늘면서 매월 600개 이상의 새로운 ‘족보’가 나오고 있다. 창성창본은 한국 국적 취득자가 원래의 외국식 이름 대신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성과 본을 정해 신청하는 절차다. 8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한국 국적 취득자의 창성창본 신청 7578건이 받아들여졌다. 월평균 632건이다. 신청자가 많다 보니 독특한 ‘족보’도 속출하고 있다. 봉황 신씨(2007년), 태국 태씨(2009년), 우주 황씨(2010년) 등이다. 체, 총, 탄, 찬, 전대, 녕, 궁 등은 단 한 명만이 쓰고 있는 성이다.
외국인들은 보통 한국에서의 정착지를 기준으로 창성창본을 많이 했다. 국내 K리그에서 10여 년간 골키퍼를 했던 ‘신의손’(현 부산 아이파크 코치)은 2000년 러시아 국적을 버리면서 ‘구리 신’씨를 택했다. 당시 소속팀이었던 안양 LG치타스의 연습장이 경기도 구리에 있었는데 거기서 따온 거였다.
이국적 이름 때문에 튀는 게 싫어 개명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 가장 선호되는 건 평범한 성이다. 2012년 1월~2013년 2월 말 사이 김씨(1893명), 이씨(1425명), 박씨(470명), 장씨(264명), 최씨(262명) 순이다. 송지연 법무사는 “한국인들의 시선이나 발음이 어렵다는 생활상 어려움 때문에 창성창본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