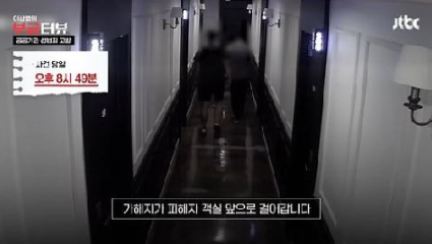남덕현
남덕현귀농수필가
빚내서 대학까정 갤쳐(가르쳐), 땅 팔어 집 사줘, 근디 왜 맨날 사는 게 대간허다구(힘들다고) 난리랴 난리가!
언제부턴가, 시골 어르신들은 서울 사는 자식들 전화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게 되었다. 가르칠 만큼 가르치고, 집 장만하는 데도 한몫 단단히 보태주었건만, 전화의 태반은 살기 힘들다는 하소연인 탓이다. 사는 게 늘 저 모양인 자식에게 언감생심 기댈 엄두가 안 난다.
부러 앓는 소리를 하는가 싶어 서운할 때도 있다. 서운한 마음에 다달이 보내주는 알량한 용돈도 이제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맞벌이를 하면서 한 달에 기백은 버는 마당에, 도대체 왜 그리 살기가 힘들단 말인가! 노름을 하는 것도, 흥청망청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다. 건실하기 짝이 없는 아들이요 며느리인데 도대체 살림살이는 왜 해마다 기울고 빚만 늘어가는가! 옆에서 지켜보자니 당신들 노후는 고사하고, 자식들 노후가 더 걱정이 될 지경이다. 안타까운 마음에 한 소리 할라치면, 으레 말다툼으로 번지기 일쑤다.
비정규직이네, 고용 없는 성장이네, 실질소득 감소네 하는 자식들 이야기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설령, 알아듣는다 한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결국,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밖에 없다. ㅡ 대간혀두 악착같이 애껴(아껴) 쓰믄서 열심히 견디야지 워쪄! 당신들이 평생 해 왔던 것, 지금도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당신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 삶의 훈장과도 같은 것, ‘아끼고 견디는 것’ 말고는 자식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 말 때문에 자식과 말다툼이 벌어진다. 뭘 더 아껴 쓰고, 얼마나 더 견디라는 것이냐고 따지고 드는 자식들 앞에서 더는 할 말이 없다.
전화를 끊고 나면,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못 배우고, 땡전 한 푼 물려받지 못했지만 이만큼 살아온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끼고 견디며 살아온 덕택이다. 그것 말고는 딱히 용빼는 재주가 있을 리 없고 별다른 삶의 지혜도 없다. 그런데, 자식들은 이제 세상은 그런 지혜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달라졌다고 말한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시골 늙은이가 보기에도,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며 견디면 잘 사는 시절이 온다는 통속은 이제 종말을 고한 듯하다.
자식의 삶이, 시대의 통속이 무너지는 한복판에 위태롭게 서 있는 시절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또 오죽하겠는가.
남덕현 귀농수필가

![[오늘의 운세] 5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세상에 홀로 나간지 8년…27세 예나씨의 쓸쓸한 죽음 [소외된 자립청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07/be204767-01c0-4ae6-bbc9-1c6fb4ac3bba.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서울 근무 중 첫사랑과 재혼…이렇게 좋은 한국, 딱 하나 아쉬워" [시크릿 대사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07/5a6917ad-45ac-49fa-8d19-85b695682267.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