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주석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에 나선 시진핑 주석(왼쪽)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 국제공항에 내리고 있다. [온타리오 AP·신화=뉴시스]
중국 국가주석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에 나선 시진핑 주석(왼쪽)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 국제공항에 내리고 있다. [온타리오 AP·신화=뉴시스]중국은 미국에 숙원이 하나 있다. 1979년 1월 1일 양국 수교 이후 34년간 추구해 온 ‘대국관계’ 정립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7~8일 미국 캘리포니아 란초 미라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는 가장 큰 목적도 이 대국관계를 재구축한 ‘신대국관계’ 확립이다. 주요 2개국(G2)에 걸맞은 대우를 받겠다는 것이다.
34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 보자. 79년 1월 28일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은 미국을 방문해 지미 카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덩은 ▶양국 우호를 다지고 ▶중국에 유용한 미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며 ▶국제평화를 위해 의견을 교환하자는 말을 했다. “미국에서 배우겠다”는 말만 빼면 중국이 밝힌 이번 정상회담 목적 그대로다. 당시 덩은 도광양회(韜光養晦·실력을 키울 때까지 참고 기다림)를 강조하며 미국과 국제질서를 논의하는 대미관계 정립을 구상 중이었다.
97년 10월 미국을 방문한 장쩌민(江澤民) 당시 주석은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시 대국관계 정립을 거론했다. 당시 장 주석은 중국의 전통 오페라인 경극(京劇)까지 부르며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자랑했다. 당시 양국 정상은 ‘건설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했다.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과 국제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확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1년 취임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합의한 양국관계를 무시하고 “중국은 전략적 경쟁상대”일 뿐이라며 국제문제 해결에 협력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면서 어떤 형태의 중국 입장도 고려하지 않았던 외교적 근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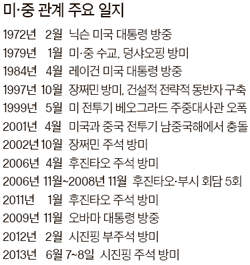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2010년 이후에도 미국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2011년 1월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윈윈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생소한 외교관계를 맺었으나 미국의 외교적 수사에 불과했다. 2010년 이후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의 인민폐 절상을 압박했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계속됐다. 지난해 9월 이후에는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이 발생하자 일방적으로 일본 편을 들었다.
지난해 11월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하며 중국 최고 권력자가 된 시 주석은 이런 대미 외교관계를 의식해 ‘신대국관계’ 정립을 주창했다. 대만이든, 센카쿠 열도 문제든, 한반도 문제 든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면 중국도 행동을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이 시 주석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지는 의문이다. 양국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미국 의원들은 중국의 정치범 16명의 석방과 인권이 열악한 중국 티베트 문제를 담당할 미국의 특사 지정을 요구하는 등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나왔다. 이전에는 천안문 사태에 대한 해명까지 요구했다.
쑤하오쩡(蘇浩曾) 외교학원 전략관리센터 주임은 “미국이 중국이 원하는 외교적 신대국관계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동반자 관계라도 구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