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하 코마스 사장은 “186명 직원 중 다른 회사로 옮기는 이는 1년에 한두 명 정도이고 차장·부장급의 이직률은 ‘0’에 가깝다”며 “연구개발을 한다는 마음으로 직원 교육에 힘쓰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종근 기자]
이태하 코마스 사장은 “186명 직원 중 다른 회사로 옮기는 이는 1년에 한두 명 정도이고 차장·부장급의 이직률은 ‘0’에 가깝다”며 “연구개발을 한다는 마음으로 직원 교육에 힘쓰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종근 기자]남의 회사가 만든 물건을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직원의 70%가 엔지니어인 회사가 있다. “인맥 관리나 고객 접대가 아닌 ‘기술’로 영업한다”는 회사다. 그래서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자 비율도 20% 이상이다. IBM, 티베로, 보메트릭, 델 같은 회사의 기업용 보안·시스템·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분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총판으로 연 매출 1219억원을 올린 코마스 이야기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코마스 본사에서 만난 이태하(52) 대표이사(사장)는 “특정 하드웨어에서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는지, 보안과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은 어떤 것들이 궁합이 잘 맞는지 기술을 꿰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제품을 한번 팔면 끝이 아니라 기술 지원과 유지·보수, 관리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코마스는 186명 직원 중 엔지니어가 130명이고 자체 개발자도 40여 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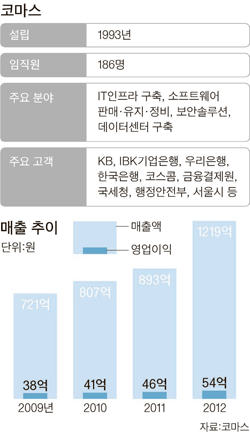
코마스는 외국계 정보기술(IT) 회사에서 한국 업무를 담당하던 이향호(52) 대표가 1993년 금융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창업했다. 이태하 사장은 전문경영인으로 2005년 코마스에 합류했다. 창업주인 이 대표가 대외투자와 인수합병 등 바깥살림을 맡고, 이 사장이 영업·자금·신사업 같은 안살림을 맡는 각자대표 체제다. 이 사장 입사 후 8년 만에 회사 매출은 6배가 됐다. 이 사장은 “대한민국 IT는 오너 때문에 크고 오너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창업주인 이향호 대표가 경영을 내게 100% 맡겨줘 마음껏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역할 갈등이 없도록 회사 정관에 아예 역할 분담을 명시했다. 이 사장 역시 임원들의 자율권을 중시한다. 상세 견적서나 제안서를 일일이 보지 않고, 각자 책임과 권한을 갖게 해준다. “파는 제품은 소프트웨어지만 결국 역량을 갖춘 사람 장사”라는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에 신경 쓴다. 회사가 순수하게 교육비로만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3억원이다. 임원들은 대학의 최고경영자(CEO) 과정을 밟게 하고, 부장급 이상은 6개월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영학석사(MBA) 과정에 등록시킨다.
코마스에는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로 정년이 없다. 1950년생의 프로젝트 담당자와 1951생 영업 담당도 있다. “열정과 능력이 있으면 나이는 관계없다”는 것이 이 사장의 지론이다. “단, 아무리 젊어도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배울 열정이 없으면 IT계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둘째로 출퇴근 체크가 없다. “고객사 지원 때문에 공휴일이나 야간에 근무할 때도 있는데, 굳이 다음날 회사에 나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코마스는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대기업의 공공 시스템통합(SI) 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과 3년간 평균 매출이 1500억원을 넘는 기업의 정부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올해 시행됐다. 대기업의 SI 진출 제한은 기회일 수 있지만 코마스 역시 지금처럼 성장하면 2~3년 후에는 정부 조달시장에 못 들어가게 된다. 이 사장은 “기업 규모로만 사업 영역을 나누기보다는 ‘국산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값을 깎을 수 있다’는 발주처의 인식을 바꾸고, 수주 과정에서 가격 산정과 회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섬세하게 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인턴 사원을 뽑을 때는 정부 보조금이 있지만 중견기업에 정말로 필요한 특허 전문가나 기술자 채용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런 우리의 고민을 수렴하는 분위기라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심서현 기자
사진=박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