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벽에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 취재진이 찾아간 12일에는 건물 위쪽의 사용후 연료 저장조에 보관된 연료봉을 회수하기 위한 준비 공사가 한창이었다. 근로자들이 크레인을 타고 4호기 건물 위쪽까지 올라가 작업하고 있다. 당일 오전의 시간당 방사선량은 95∼200μ㏜이었다. [후쿠시마 제1원전 공동취재단]
건물 벽에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 취재진이 찾아간 12일에는 건물 위쪽의 사용후 연료 저장조에 보관된 연료봉을 회수하기 위한 준비 공사가 한창이었다. 근로자들이 크레인을 타고 4호기 건물 위쪽까지 올라가 작업하고 있다. 당일 오전의 시간당 방사선량은 95∼200μ㏜이었다. [후쿠시마 제1원전 공동취재단]일본 도쿄에서 밤길을 달려 약 220㎞ 떨어진 후쿠시마 원전 복구 작업 전진기지인 J빌리지에 도착한 것은 12일 오전 8시. 한국 특파원단은 이곳에서 지난해 3월 11일 원전사고 이후 1년7개월 만에 처음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을 취재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방진복과 장갑(3겹), 신발 덮개(2겹), 두건과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했다. 일본 취재단과 함께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20㎞ 떨어진 원전으로 출발했다. 원전 주변 20㎞권 안쪽의 마을은 말 그대로 ‘유령 마을’이었다. 2년째 농사를 짓지 못한 논과 밭에는 잡초(양미역취)의 노란색 꽃이 가득했다.
원전으로 다가갈수록 동승한 도쿄전력 직원이 손에 든 휴대용 측정기의 방사선량은 높아졌다. 시간당 6마이크로시버트(μ㏜)로 올라가자 일반 마스크를 방독 마스크로 바꿔 착용해야 했다.
원전 정문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21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1호기는 지붕에 초대형 커버(천막)를 뒤집어씌워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출입구 난간은 뒤틀린 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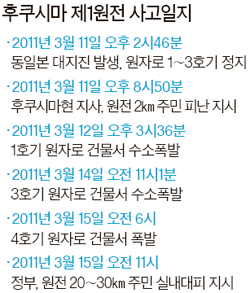
바깥보다는 덜하지만 버스 내부의 방사선량도 점점 올라갔다. 3호기 주변에서 시간당 300마이크로시버트를 기록하더니 4호기에 접근할 때쯤 1000마이크로시버트로 껑충 뛰었다. 서울의 1만 배, 도쿄의 2만 배다. 4호기 부근은 수치가 높아 무인 대형 크레인을 무선으로 조작하면서 자재를 옮기고 있었다. 부근에는 지난 8월에 원자로 건물에서 꺼냈다는 지름 10m짜리 노란색 격납용기 뚜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3, 4호기 주변에는 쓰나미가 할퀴고 간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건물 옆 철골은 엿가락처럼 구부러진 채 붉게 녹슬어 있었고 트럭과 승용차들이 뒤엉켜 처박혀 있었다. 시간당 방사선량이 95~200마이크로시버트로 비교적 낮은 곳을 골라 취재진이 버스에서 내렸다. 허락된 취재 시간은 단 10분. 원자로 건물 내부는 높은 방사선량 때문에 진입할 수 없었다.
다카하시 다카시(高橋毅·55) 소장은 “외부에서 보면 왜 이리 복구작업이 늦냐고 할지 모르나 여전히 방사선량이 매우 높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언덕 위쪽으로 이동한 취재진은 넓은 평지에 건설 중인 물 정화장치 주변에서 또 한 번 내렸다. 이곳에선 계속 불어나는 ‘오염수와의 전쟁’이 한창이었다. 해발 35m 높이의 언덕 쪽에서 해발 10m밖에 안 되는 사고 원자로 쪽으로 지하수가 흘러내려가 오염수가 늘어나는 것이 큰 문제였다. 도쿄전력은 고민 끝에 언덕에 깊이 30m의 우물을 10여 개 파서 지하수를 퍼낸 뒤 곧바로 바다로 흘려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이다.
2시간30분간의 취재를 마치고 J빌리지로 돌아와 확인한 취재진의 누적 피폭량은 52~58마이크로시버트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 공동취재단




![[오늘의 운세] 5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