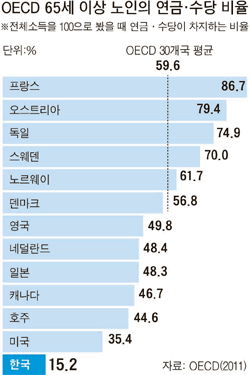
혼자 사는 노인의 월 소득은 지난해 기준으로 70만원(부부 노인은 149만8300원)이다. 이는 최저생계비(55만3300원)의 1.26배로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 저소득층) 경계선을 살짝 넘는다. 노인들의 평균적인 삶이 저소득층과 다름없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곤궁한 이유는 연금·수당 등 공적 이전소득이 월수입의 35.2%밖에 채워주지 못해서다. 공적이전소득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이를 받는 노인은 28.2% 정도이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포함해도 30%를 약간 넘는다.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도 28만원에 불과하다. 이게 도움이 안 되다 보니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출 사업을 했더니 두 달 만에 6000명이 몰렸다. 전월세 자금이나 의료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은 도입(1988년)했는데 지금의 노인들이 한창 일할 당시엔 보험료를 부을 여유가 없었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은 연금에 가입할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OECD 선진국은 연금제도를 100년 가까이 운영한 곳이 많다. 이런 국가들은 대개 평생 번 월평균 소득의 60~70%를 연금으로 받는다. 프랑스 같은 데는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87%나 된다.
선진국 노인들은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의 ‘3층 구조’를 잘 쌓고 있다. 한국은 걸음마 단계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보험연구원 이경희 연구위원은 “퇴직금도 중간정산을 해서 줄어든 경우가 많고 50대 초반에 퇴직금을 갖고 회사를 나오지만 사업자금·자녀학자금 등으로 대부분 써 버린다”고 지적한다. 개인연금도 마찬가지다. 숭실대 신기철(보험수리학) 교수는 “지금의 노인들은 개인연금에 가입했어도 20년 이상 되는 장기보험을 택한 경우가 드물어 노후 소득 보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선진국 노인들은 부자지만 한국 노인의 47%가 상대빈곤(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 가운데 이하)에 빠져 있다. 노인 중 스스로 생활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는 자식이 부모 지갑의 40%가량(2011년 기준)을 채워준다. 효가 남아 있다. 하지만 자식들도 먹고살기 힘들어지면서 3년 전 46.5%에 비해 줄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는 “하위소득 70% 계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월 9만4600원)을 어려운 노인에게 많이 주는 식으로 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연구원 이경희 연구위원은 “영국처럼 퇴직금의 상당액(영국은 75%)을 연금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점 만점에 11점"…英 독설 심사위원 놀래킨 '3분 태권 무대' [영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6/2b284bb2-8e01-43b7-8a9e-8da5c241b0ea.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