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의 양상이 달라졌다. 과거엔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이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했다. 빈곤의 원인은 주로 노동시장에서 일시적인 수급 불일치 탓에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성장이 경제 전체의 고용과 소득으로 파급되는 정도가 미미해졌다. 중소기업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용이 속해 있는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지체되고 있다. 이게 현재 빈곤이 확대되고 유지되는 원인이다.
윤희숙(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1990년 이후 한국경제 구조 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의 셋 중 하나 정도는 장기·반복적 빈곤 상태에 있다. 한국노동패널 3~11차 조사 중 5번 이상을 응답한 가구주 중 항상 빈곤 상태에 있거나 장기·반복적 빈곤에 있던 가구주(3회 이상 빈곤 경험)는 전체의 27.4%에 달했다. 이들 중 55.9%가 미취업 상태였고 자영업자 비율 역시 19.9%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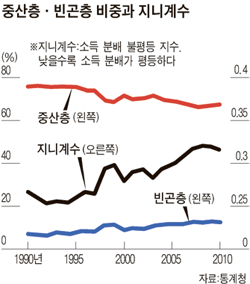
윤 박사는 “외환위기 충격 이후 임시·일용직의 증가로 빈곤이 악화됐다는 주장과 달리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는 1990년대 초·중반부터 관측되기 시작했다”며 “빈곤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구조적 변화는 ‘제조업의 위축과 서비스업의 확대 과정’을 말한다. 선진국의 탈공업화는 산업화가 무르익은 후 자연스럽게 서비스업으로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탈공업화는 급속도로 진행됐다. 중국과의 무역이 급증하면서 이들과 제품 차별화가 되지 않는 노동집약적 부문이 급속히 붕괴했다. 이 과정에서 강제로 퇴출된 노동자는 생계형 서비스업의 저임금 일자리로 흡수됐다.
그게 ‘서비스 경제화의 본질’이었다. 그는 “‘방출 노동력의 저수지’가 된 서비스 부문이 생산성의 지체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소득격차를 확대하고 이것이 다시 경제 전체의 구매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약해 빈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근로자의 보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8년 현재 57% 수준에 불과하다. 그는 “미취업자와 자영업자가 장기, 반복적인 빈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는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가 빈곤 정책의 핵심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정규직에 따른 소득 차이보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격차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는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체의 경우 정규직이라도 고용보험 가입률이 36.2%에 불과한 반면 30인 이상 사업체는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80%에 달해 정규직 여부를 경제적 취약성과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박사는 빈곤 정책 전반의 구조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금 지원에서 벗어나 고용 지원과 소득 보조를 통한 자립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거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정부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꼽았다. 그는 “생산활동 참가 여부가 빈곤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경제활동 참가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용지원 서비스가 그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