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트위터 이용자 수는 300만 명이 넘는다. 140자 이내로 손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강점에 대해선 많이들 소개됐기에, 여기서는 약점을 짚어보려 한다.
먼저 트위터에 적극적으로 글을 올리는 소수 이용자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유통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에 트위터를 이용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의 의견 출구는 넓지 못하다. 트위터에서 글쓰기를 좋아하는 이용자의 시야에 들어온 사건만이 뉴스화되기 때문이다. 예전에 뉴스 가치를 판단할 때 ‘다수’의 ‘중요한’ 이야기가 초점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의 사소한 이야기까지 뉴스로 떠다닌다.
트위터의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일방향적이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임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널리 뿌리기만 하며 소통이 잘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허브 이용자의 허락 없이도 어느 사람의 글이 타임라인에 항상 들어와 있도록 팔로우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글을 ‘구독’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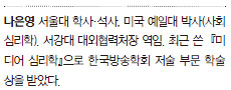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력은 팔로어 수보다 메시지의 리트윗 수로 결정된다. 리트윗이 많이 되려면 양질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정보의 질이 떨어지면 언팔로우를 통해 트윗의 구독을 쉽게 중지할 수 있어서다. 팔로어를 많이 거느린 이용자들은 독자에 대한 일종의 의무감 때문에 글을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 있다. 많은 글을 올리느라 또는 친밀감을 나타내느라 신변잡기를 포함시킨다. 소수 이용자의 사소한 이야기가 다수 이용자의 중요한 이야기보다 더 많이 회자될 수 있는 구조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트위터에도 적용된다. 트위터에 자기와 같은 의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침묵하게 된다. 물론 1% 미만의 엘리트 이용자들은 적극 의견을 피력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긍정적 관계를 지속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아니라 유사한 의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비율이다.
예컨대 트위터에 올라오는 보수·진보 의견의 양이 불균형적일 때, 사람들이 ‘지각하는’ 의견의 비율은 실제 세상이 아닌 트위터상의 의견 비율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세상의 진짜 의견 분포에 대한 지각이 방해를 받게 된다.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의견의 분포는 트위터에 올라오는 것들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트위터들은 호혜적이며 배려심이 높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트위터는 상대방의 멘션에 반응하는 비율이 11%인 데 비해 한국인 트위터는 80.6%에 달한다. 이런 호혜성은 상대를 배려하는 한국인의 장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때로 역으로 작용해 ‘끼리끼리 커뮤니케이션’의 폐해를 낳는다. 한국 트위터의 맞팔률은 68%인데 국제적 평균인 22.1%보다 훨씬 높다. 한국인 트위터 간 평균거리는 3.8단계로 국제적 평균 4.1단계보다 짧다. 의견이 같은 사람끼리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소통의 질이 편파적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용자들은 연속적인 팔로어 관계를 통해 자기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도 접하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 멘션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기와 비슷한 의견을 더 많이 읽으며 양극화될 가능성이 훨씬 큰 게 사실이다. 따라서 트위터를 즐기더라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트위터에 올라오지 않는 의견들은 어떤지에 항상 관심을 두어야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 전체의 소통에 기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