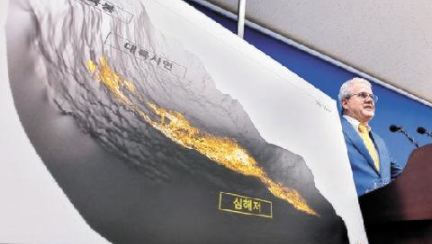한자 ‘僞(위)’는 지금 ‘거짓’이라는 뜻으로 통하고 있지만 원래는 ‘사람(人)의 행위(爲)’라는 의미였다. 자연 그대로가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뜻이다. 춘추전국시대 ‘僞’와 ‘爲’는 구분 없이 섞여 쓰였다.
맹자의 ‘성선(性善)’을 반박하고 ‘성악(性惡)’을 주장한 순자(荀子·BC298?~BC238?)는 ‘僞’를 이렇게 정의한다. “배울 수 없고, 이룰 수도 없지만 사람에 내재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일컬어 성(性)이라고 한다. 사람의 내부에는 또 배워 능히 이루고, 일을 도모해 성취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곧 위(僞)다(不可學,不可事而在人者,謂之性;可學而能,可事而成之在人者,謂之僞).”(『순자』 성악편). 그는 사람의 본성은 본디 악한 것이며(人之性惡), 사람이 배워 착하게 행동해 악을 극복하는 것이 ‘위’라고 했다(其善者僞也). 그가 예(禮)를 중시하고, 교육과 수양을 강조한 이유다.
‘僞’가 거짓이라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전국시대 말기, 한(漢)나라 초였다. 한나라 초기 자전이었던 『설문(說文)』은 ‘僞’를 ‘詐(사)’라고 했다(僞, 詐也). 거짓으로 꾸며댄다는 뜻이다. 『설문』은 또 ‘詐’를 ‘欺(기)’라 했다(詐, 欺也). 위(僞), 사(詐), 기(欺)는 이렇게 서로 통하는 말이다.
그러나 쓰임새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 ‘僞’는 사람이 의도를 갖고 허위로 꾸며내는 것을 지칭했고, ‘詐’는 교묘한 말로 상대를 속이는 것을 뜻했다. ‘欺’는 인의(仁義)에 어긋나는 부정행위를 통칭했다. ‘거짓’을 뜻하는 말로는 이 밖에도 눈속임을 뜻하는 ‘만(瞞)’이 있고, 진실이 아닌 것을 일컫는 ‘가(假)’도 있다. 알맹이를 빼고 빈 껍데기만 보여주는 것을 ‘허(虛)’라 했다. 거짓을 묘사한 단어가 이렇게 많은 것은 그만큼 남을 속이는 행위가 다양했기 때문이리라.
고위 공직자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만 열면 온갖 허위(虛僞)와 위장(僞裝), 허세(虛勢)가 난무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위장전입, 부동산 세금 허위 신고 등을 일삼고도 공직을 맡겠다고 나서니, 또다시 국민을 기만(欺瞞)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사람이란 본래 악(惡)한 존재이었던가…. 예(禮)는 어디 가고, 법(法)은 또 어디에 있는가.
한우덕 중국연구소 차장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