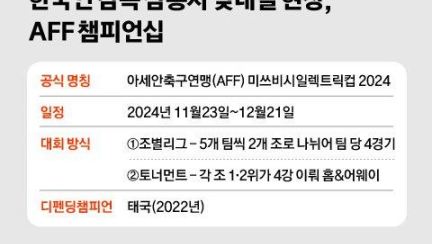지난주 금요일 밤 11시 홍익대 앞 클럽 마트마타. 입장료 1만원을 내자 손목 안쪽에 'MATMATA'라고 새겨진 스탬프를 찍어준다. '쿵, 쿵, 쿠쿠쿵∼'하는 묵직한 리듬이 새어나오는 문을 열자 얼굴엔 후끈한 열기가 훅 불어온다. 동시에 심장이 리듬에 맞춰 들썩거릴만큼 큰 볼륨의 음악이 온몸을 때린다. 20여평이나 될까 말까한 지하실, 빼곡히 들어선 1백명 남짓한 젊은 남녀들이 파도처럼 흔들린다.
모두 주술에라도 걸린 걸까. 클럽을 꽉 채워 서로 팔 다리를 부대껴도 젊은이들은 그저 음악과 춤에 취해 '무아지경'에 빠진 듯 아랑곳하지 않는다.
"주로 친구들과 어울려 오지만 혼자 와도 상관없어요. 누구랑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음악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죠."
홀 가장자리에 서서 얘기를 나누던 홍민정(27·외국인회사 근무)씨는 얘기하다 말고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자 두말 없이 팔을 쳐들면서 홀 가운데로 미끌어져 들어선다. 대화를 나누기 전 옷차림만 봤을 때는 도저히 평범한 직장인같아 보이지 않았다. 배꼽이 보이는 검정색 끈소매의 웃도리와 몸에 달라 붙은 청바지와 힐, 십수 개의 링이 찰랑찰랑하는 팔찌와 양쪽 두세 개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는 연예인을 연상케할 정도다. 금요일 퇴근길에 종종 클럽을 찾는다는 홍씨는 자신을 당당히 '클럽 매니어'라 소개했다.
홍대 앞 거리는 클러버(clubber:클럽을 찾는 사람들)들의 천국이다. 홍대 앞 정문에서 극동방송국 쪽으로 가는 길 오른쪽 골목 구석구석이 바로 클럽 골목이다.
이중 '흐지부지'와 '스카' 등은 이미 5∼6년 전부터 일부 학생과 영화·음악·방송계 종사자 등 소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홍대 앞 클럽이 더이상 소수 매니어의 공간이 아니라 대중의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1년 넘게 매달 젊은이들을 홍대 앞으로 끌어모았던 '클럽데이' 효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클럽데이'는 이를테면 '클럽 뷔페'의 개념.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로 고정된 클럽데이엔 1만원짜리 티켓 하나만 가지고 홍대 부근에서 내로라하는 클럽 열 곳을 모두 오가며 즐길 수 있다. 첫 클럽에서 맥주 한 병이나 음료수 한 잔이 제공되며, 나머지 클럽에선 입장료가 면제된다.
클럽데이 추진위원회 대표 채희준씨는 "바로 1년 전인 지난해 이맘 때만 해도 클럽데이를 어떻게 알리느냐가 주된 고민이었다. 지금은 10개의 클럽이 폭발할만큼 넘쳐나는 클러버들 때문에 고민이다. 인원을 5천명으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천 5백명에 그쳤던 참가자들이 요즘엔 6천명으로 불었다.
BMG코리아 정지은 대리 역시 자타가 공인하는 클럽 매니어. 평소에도 대담한 옷차림으로 직장 동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녀는 클럽에서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다. "클럽에서 제대로 즐기려면 오히려 술을 덜 마시는 게 낫다"고 한다. "호텔 클럽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싼 5천∼1만원 정도로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드물지 않냐"고 반문했다.
클럽이 늘어나다보니 클럽이 음악 장르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는 것도 색다른 점이다. 각 클럽들은 힙합과 테크노·록 등 각기 고집하는 음악 장르에 따라 각기 다른 고객을 갖고 있다. 현재 홍대 앞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 DJ만 해도 40∼50명선. 각기 다른 개성과 취향이 중요한 컨셉이 되다보니 각 클럽이 커뮤니티적 성격을 갖는 것도 특이하다. 각 클럽들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홈페이지나 다음 카페 등에 커뮤니티 공간을 갖고 있다.
<그래픽 참조>
그러나 홍대 앞 문화에 대한 비판도 적잖다. 상대적으로 록 그룹의 라이브 연주를 들려주던 라이브 클럽 등이 문을 닫으면서 '언더문화의 산실'로 불렸던 홍대 앞의 위상은 사실상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브 클럽 롤링스톤스에서 인디레이블 홍보를 맡고 있는 정희균씨는 "97∼98년만 해도 홍대앞은 인디 밴드들의 본거지로 말 그래도 '문화발전소'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지금은 라이브 문화의 매니어 팬들이 급격히 줄면서 절반 가량의 라이브 클럽이 문을 닫았다"며 안타까워했다.
현재 홍대 앞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라이브 클럽은 크라잉 넛을 배출한 '드럭'을 비롯해 재머스·롤링스톤즈 등 소수에 불과하다. 힙합 전문 클럽이었던 마스터 플랜, 데스·슬래시 메탈 등 매니어 장르의 라이브 연주를 하던 '노노' 등은 모두 문을 닫았다.
대중음악평론가 송기철씨는 "홍대앞 문화가 젊음과 에너지의 공간으로 자리잡은 것은 이곳이 '인디의 메카'였기 때문"이라며 "라이브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롤링스톤스의 정씨는 "라이브 클럽의 인기를 되살리려면 이들 클럽을 기반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밴드들의 애정과 관심은 물론 클럽 운영자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대 앞의 클럽 문화가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려면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했다는 한 직장인은 "싼 값에 음악과 춤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클럽의 지저분한 화장실을 보면 낯뜨거워질 때가 있다"면서 "옷과 가방을 제대로 맡길 수 있는 클록 룸과 깨끗한 화장실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글=이은주, 사진=김태성 기자
ju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