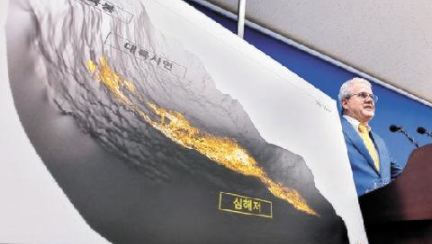비뇨기과 의사로 50년을 지내면서 남자의 외도 행각을 어렴풋이 정리한다면 용모 중심과 성감 중심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곽대희의 性칼럼
즉 얼굴이 예쁘거나 체격이 팔등신으로 고른 분포 양상을 보이는 여자에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섹스가 남다르게 발달한 여자를 좇는 수컷 기능에 치중한 남자가 있다.
이것은 일종의 취향인데 이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간과되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다. 그래서 엽색 행각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노숙자가 된 사람, 성적 쾌락에 탐닉했지만 가업을 물려받아 개인적 몰락을 회피한 사람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섹스로 인해 망가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시중의 가난한 샐러리맨이나 한 나라의 제왕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
프랑스의 제왕 루이 15세가 그런 사람이다. 그는 요즘 일부 연예인이 자랑인지 흉허물인지 모르고 떠드는 ‘섹스 중독자’의 전형적 인물이었다. 그는 성의 환락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다가 회갑도 되지 않아 육신을 쓸 수 없는 만신창이 상태가 됐다.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섹스가 불가능한 발기부전 상태에 빠져 버렸다.
그 어떤 미녀도 이 불행한 제왕에게 근접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무절제로 손상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면하고 말았다. 중국에서는 귀족들의 행태가 음란해서 패륜적 성생활을 즐기는 영웅과 황제가 부지기수였다. 『사기(史記)』를 보면 폭군들은 대개 암살이나 과음(過淫)에 의한 병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런 궤도를 벗어난 수레 모습의 섹스가 일정한 룰을 가지게 된 것은 도교가 보급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섹스는 양생(養生)의 방편으로 변형됐다. 즉 치수가 국정의 안정을 가져다준다는 치산치수(治山治水)론에서 준용한 것인지 섹스를 조절할 수 있으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이론이 중국 의학의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 이론에 따라 청대의 황제들은 과음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방사 수칙을 정해 환관의 통제 아래 두었다. 불법과 무법의 온상이었던 중국의 이런 변화는 통치자의 섹스 통제라는 새로운 풍습을 만들어 갔다. 즉 공개적 후궁제도에서 한두 사람의 섹스 파트너를 두고 프라이버시의 노출을 차단하는 섹스 방식이다.
『모택동의 사생활』이란 저서에 따르면 중국 혁명의 기수 마오쩌둥(毛澤東)은 남성호르몬을 보강해가며 성이 만들어내는 유열에 푹 빠졌다. 과거에는 ‘영웅은 색을 좋아한다’는 말로 일반적 모럴에서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렸으나 권력자의 자유분방한 성생활이 여성의 희생을 근거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인권운동 내지는 여성운동의 역풍을 맞았다.
특히 동양문화권에서는 여자 문제가 정치인의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아주 많았다. 아무리 막강한 폭력을 행사하는 냉혈의 독재자라고 해도 국민의 여론은 억누를 수 없었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예로 보면 훌륭한 사내라고 하는 족속은 거의 모두 부인과는 별도로 애인을 둔다.
그러다가 머지않아 사랑이 식고 육체 관계가 없어진 후라도 그 애인을 만나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 것이 이상적 관계라는 식의 사고가 선진국형 애정관이다. 섹스 관계가 없어졌어도 우정 관계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면 얼마든지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 그들의 성 모럴인데, 우리도 차츰 그쪽으로 다가가는 중이다.
곽대희 비뇨기과 원장
<이코노미스트 1032호>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