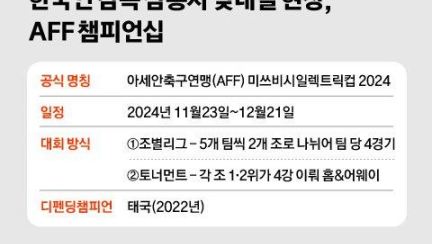그곳은 백악관에서 아주 가깝다.
느릿한 걸음으로도 3~4분 남짓이면 충분하다.
워싱턴 DC의 19가 1220번지.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서니 군데군데 시가를 피워 문 사람들이 보인다.
남녀 모두 정장차림이다.
은은한 조명 아래 쿠바의 음악이 잔잔히 흐른다.
올 3월에 문을 연 시가클럽 '그랜드 하바나 룸' 실내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상쾌하다.
회원에게만 입장이 허용된다.
개인은 입회비가 2백만원에 월회비 15만원, 법인회원의 경우는 5백만원에 30만원씩이다.
클럽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가습기가 달린 개인 시가보관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사는 돈이다.
정작 시가.술.음식 값은 따로 부담해야 한다.
90년대판 귀족클럽이라고나 할까. 클럽의 문은 항상 잠겨 있다.
회원들은 주어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
회의장. 파티장. 비지니스 상담장소가 늘어서 있고 한잔에 95달러가 넘는 루이 13세 코냑 등이 제공된다.
1억여원짜리 환기시설은 1백명이 동시에 시가를 피워대도 괜찮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다.
조명기구는 전구의 열이시가 맛을 변하게 하지 않도록 영국에서 특수제작된 것이다.
바닥은 양탄자, 의자와 탁자는 모두 가죽과 비로드로 감싸여 있다.
'최고급 냄새' 가 시가 향보다 더 진하다.
워싱턴의 '원조 시가 바' 는 2년전 로비스트들이 많이 모여 있는 K스트리트의 '오지오'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손님이 몰려들었다.
지금은 워싱턴에만 시가 바가 22군데나 된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 바로 맞은편에 생긴 '셀리의 뒷방' 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이름이 달린 보관함도 눈에 띈다.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낼 곳에서부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시가 바의 종류는 다양하다.
'시가 메뉴' 는 물론 따로 있다.
값은 천차 만별이다.
그랜드 하바나 룸 옆에 붙은 시가 전문 판매점의 시가는 3달러 짜리 '찰스대제' 에서 시작한다.
최고급 시가는 개당 36달러 (3만여원)가 넘는 '파르타가스 150 아니베사리오 AA' 다.
개당 10달러 남짓의 도미니카 공화국 시가가 가장 많이 팔린다.
그러나 시가 바에서 주문할 경우 값은 보통 두세배로 뛴다.
시가에 대한 관심은 워싱턴에서만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이미 2년전 베벌리 힐스에, 올 1월엔 뉴욕 5번가 666번지에도 같은 이름의 클럽 체인점이 등장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는 20개의 시가 바가 성업 중이다.
시가 전문판매점은 무려 40군데다.
롱 비치나 덴버에서도 역시 선풍.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빌딩내의 신문판매 가게는 최근 고급시가를 유리상자에 담아 파는 상혼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갑작스레 시가가 되살아나는가.
우선은 파급력이 큰 대중 연예인들의 시가선호를 들어야 한다.
베벌리 힐스에 있는 그랜드 하바나 룸 클럽의 회원중에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로버트 드니로, 잭 니콜슨, 제임스 벨루시, 대니 드 비토 등이 포함돼 있다.
데미 무어와 마돈나도 간혹 시가를 문다.
몇년째 이어진 미국경제 호황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풍요로우면 향수가 싹튼다고 했던가.
영화 'LA 콘피덴셜' 등에서 짐작되는 복고풍 말이다.
실제로 일부 상류계층에서 '옛날의 좋았던 시절' 을 돌이키게 해 줄 무언가를 찾기에 열심이다.
본인들의 어린 시절, 시가를 피우던 '아버지' 모습은 권위와 행복의 상징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을 오늘에 재현하는 일이란…. 묘한 여운이 남는다.
미국의 금연운동이 유별나다.
흡연자는 곧 소수민족이거나 천박한 사회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다시피 한다.
그런 분위기를 피해 담배를 즐기고 싶은 백인 흡연자들로선 '나는 다르다' 는 심리적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시가는 바로 그 급소를 찌르고 있다.
천차만별의 등급을 이용하면 사치와 허영을 자극하기 손쉬운 얄팍한 상술 같은 것. 흑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사.변호사.로비스트.정치인 등 이른바 전문직 종사자들이라고 한다.
비싼 시가를 그들 말고 누가 피울 수 있으랴. 물론 워싱턴의 허름한 시가 바엔 '신분상승을 꿈꾸는 애송이' 들도 많다.
그렇다면 시가 바를 기웃거리는 한국의 기자는 무엇일까. 그리고 서울에선 지금 시가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워싱턴 = 이재학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