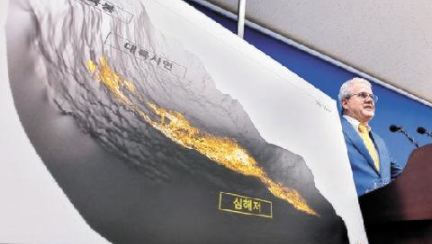영국 런던 극장 밀집지역인 웨스트 엔드(West End)의 불황이 심각하다. 최근 일간지 가디언은 이곳의 절망을 진단하며, 세계 공연 중심지로서의 역할에 의문을 던졌다.
지난 '5월 쇼크'는 대단했던 모양이다. 이곳 극장의 3분의 1을 소유한 대표적인 극장 체인인 RUT(Really Useful Theatres)의 최고경영자 안드레 파친스키는 "최근 몇 년 사이 최악의 5월"이라고 평했다. 신작들이 줄을 잇는 '황금 시즌'이지만, 런던극장협회는 지난해 동월 대비 3%의 관객 감소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5~6월 이곳에 첫선을 보인 연극 6편과 뮤지컬 2편이 '초전박살'났다. 화제의 연극 '퍼디 미어스(Fuddy Meers)'도 이 가운데 하나. 샘 멘데스의 신설 연극.영화사 스캠프의 첫 작품인데 그만 참패하고 말았다. 멘데스는 데뷔작인 영화 '아메리칸 뷰티'로 오스카상을 석권한 영화.연극.뮤지컬계의 귀재다. 이런 흥행 보증수표가 부도를 낸 것이다.
이러자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랐다. 웨스트 엔드의 노후한 극장 시설이 '주범'으로 지목됐다. 점차 관객들이 고액을 지불(런던 교외에 사는 두 사람이 시내에 와 저녁을 먹고 공연을 보는 데 드는 비용이 200 파운드, 약 40만원이다)하며 불편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보다 세련된 신흥 극장 쪽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이야기다. 웨스트 엔드 극장은 대부분 19세기 말에 건립돼 편리성은 낙제점이다. 요즘 기대치로 40여개 극장을 리모델링하려면 15년간 2억5000만파운드(약 5000억원)가 든다고 하니, 웨스트 엔드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역지사지 하면 남의 일 같지 않다. 당장 세계 유례없는 소극장 클러스터인 대학로가 떠오른다. 이곳의 열악한 극장 환경은 말할 나위 없다. 이젠 내용(작품)이 아무리 좋다 해도 공간의 편리성 등 외적 조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관객의 기호를 채울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극장 건립에도 백년대계의 혜안이 필요하다.
정재왈 공연평론가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