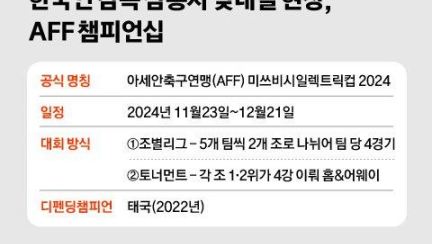고대 문명은 강이나 바람이 상류의 흙을 하류로 실어 날라 형성된 충적토(沖積土)에서 생겨났다. 이집트 문명의 어머니는 해마다 유기물이 풍부한 모래를 운반해 온 나일강이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으로, 비옥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번영한 문명이었다. 인더스 문명은 2600㎞에 이르는 거대한 강이 엄청난 삼각주 평야를 만들었기에 가능했다. 황하 유역에서 발달한 중국 문명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금 그들 지역은 문명의 발상지로 볼 수 없을 만큼 대부분 황폐하고 메말라 있다. 그것이 문명의 찬란함을 후대로 이어가지 못한 이유이기도 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한정된 토지에 기생해 살게 됐다. 토질을 개선하려는 생각은 없이 '착취'농업만 발전시켰다. 결국 흙은 양분을 잃어갔고, 전쟁과 건조한 날씨 등이 겹치면서 문명은 모래바람 속에 저물었다.
문명이 빚어낸 토양의 비극은 고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1930년대 미국 중서부의 드넓은 지역에선 바람에 의해 표토(表土)가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다. 유럽 지역으로 식량을 내다팔기 위해 짧은 시간 내 무리하게 많은 농지를 개간했다가 때마침 대(大) 가뭄이 들면서 벌어진 참사였다. 농민들이 목놓아 울었지만 황폐화는 멈추지 않았다.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가 나온 것도, 미국에서 토양 보존의 필요성이 고개를 든 것도 그쯤이었다.
경남 고성군에서 발생한 괴질이 60년대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은 공해병 '이타이이타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폐광에서 흘러나온 중금속이 토양을 오염시킨 탓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국은 '토양 사회'를 어지럽힌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토양이 생명의 모태이자 문명의 미래임을 역사는 말하고 있다.
이규연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