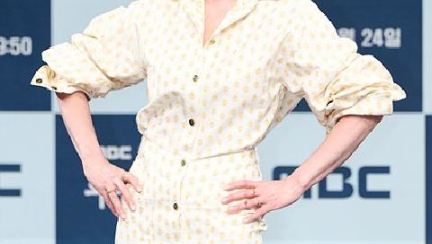18대 국회의원 299명의 임기가 30일 개시된다. 이념(理念) 과잉과 무능 정치 논란 속에 17대 국회는 내일이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될 것이다. 18대 의원들은 저마다 포부와 의욕으로 4년 의정활동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국민은 의원들에게 자연권의 일부를 위임했다.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이다. 국가도 그들에게 헌법기관의 권력을 부여했다. 입법자이자 입법부의 일원이 된 것이다. 이처럼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별도로 독립적인 권력의 원천을 갖고 있다.
다음 달 5일 개원국회에서 의원들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익을 우선하며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이란 취지의 의원선서를 하게 된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은 이때 문을 연 18대 국회의 출범에 거는 기대는 크다. 아울러 입법자들이 진지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
18대 의원들에게 개헌 논의를 당부하는 건 그들이 준수해야 할 헌법에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결함을 제거하는 개헌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 대통령이나 예비 대권주자들의 개헌 논의엔 불순한 동기가 뒤따를 수 있으니 국회의원들이 직무상 양심에 따라 초당적으로 개헌 논의를 주도하길 바라는 것이다. 1987년 아홉 번째 개정된 현행 헌법은 시민 민주주의의 열정을 담아낸 헌법이다. ‘87년 헌법’은 민주화 시대에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어릴 때 입었던 맵시있는 옷도 어른이 되면 사이즈가 더 큰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 개헌 공론화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87년 헌법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을 차례로 탄생시키면서 ‘대통령 무책임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원래 이 헌법의 교과서적 특징은 미국과 같은 대통령 책임제였다. 대통령 책임제가 무책임제가 된 건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해놨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헌법 70조의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5년 단임의 무책임성과 비전 부재, 국력 소모는 당시 민주화의 열기에 묻혀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게 정설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붕어빵처럼 되풀이되는 ‘정치 실패’의 패턴을 보면서 비로소 이 조항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단임제는 대통령이 집권 과정에서만 평가받고 정작 대통령이 된 뒤엔 실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헌법 구조다. 임기 중반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종종 보였던 무책임성은 여기서 나온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세종대왕같이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임기 이후인 5년 뒤 미래를 설계하기 쉽지 않다. 단임제의 비전 부재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정치학자는 이런 단임제 권력구조에선 현직 대통령과 차기 예비 대권주자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갈등도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필연적 분리를 가져오는 헌법의 문제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대통령 단임제로 운영되는 나라는 한국 말고는 멕시코의 7년 단임제밖에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정부의 임기는 4년인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기에 나타나는 임기 불일치 현상은 숱한 국력 소모를 가져왔다. 2006년 지방선거→2007년 대선→2008년 총선처럼 매년 전국 선거를 치르는 일이 다반사다. 선거는 시민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일말의 포퓰리즘 속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조정해 3대 동시선거로 가든, 대선 2년 뒤 총선을 치르는 중간평가 선거로 가든 변화가 필요하다.
권력구조 개편은 미국과 같은 4년 중임제의 정통 대통령제, 독일·일본 같은 총리 중심의 내각책임제, 프랑스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의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프랑스형의 분권적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총리는 국회의 다수당 대표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중 나름대로 연구 끝에 분권형과 비슷한 제도를 선호했다. 이 밖에 개헌 논의의 대상엔 지방 분권을 강화하거나 미래 과학의 진전에 따른 생명권의 규정 같은 철학적 문제도 다수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18대 국회 제1호 의원 연구모임은 ‘일류 국가 헌법연구회’라고 한다. 벌써 50여 명의 의원이 가입했다. 이들이 중심이 돼 21세기 국가 디자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헌법 논의를 진척해 주길 바란다. 2010년엔 지방선거가 있고 2012년엔 총선·대선이 있는 만큼 개헌 프로세스의 적기는 올해 시작해 2009년 여름께 완료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나 그렇듯이 개헌 논의는 정쟁화되고 또다시 19대 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오늘의 운세] 6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