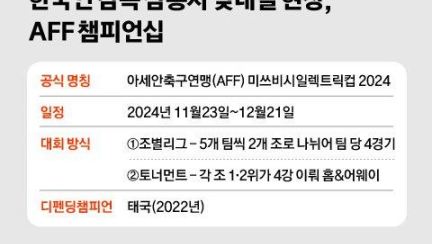제1부 불타는 바다 떠난 자와 남는 자(23) 화순의 어깨 너머로 길남은 캄캄하게 어두운 바다를 내다보았다.저쪽이 아니다.헤엄쳐 건너야 할 바다는 내 등 뒤쪽이다.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난 이 여자에게 발목을 잡혀야 하나.
명국이 아저씨도 말하지 않던가.큰 일에 계집 끼워넣지 말라고. 그러나 난 지금 어느 것이 큰일인지를 모른다.내게 있어 크다는 건 뭔가.화순이도 크다.내게는 첫여자다.그것이 어찌 크지않단 말인가.
『그래서,그래서 말이다.너 끝까지 나랑 함께 하겠다는 거니?』 『그럼 한입으로 두말 할까.』 『날 따라나서겠다는 거냐? 이게 어디 놀이라도 가는 건 줄 아니?』 『혼자는 못 보내.내가 못 해.』 그녀를 안은 팔에 힘을 주면서 길남이 말했다.
『죽어도 살아도 같이 해야 할 일이다.돌이킬 수 없는 일이란말이다.』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 붙안고 있던 화순의 어깨를 잡으며 길남이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방법은 있다.내가 가서 자리잡은 후 널 부를 수도 있는 거야.넌 우리하고는 다르잖니.』 『마찬가지야.병들거나 죽거나,그렇게 해서 저 육지로 나가기는 마찬가지야.』 『왜 그렇게만 생각하지.』 화순이 고개를 들며 또박또박 말했다.
『버리든가,데리고 가든가 그 길밖에 없어.너 하자는대로 따를거야.』 『네 생각을 묻는 거다.』 『난 함께 갈 거야.그러고싶어.』 못할 짓이로구나.살아서 할 짓이 아니로구나.화순의 등에 팔을 돌려 안으면서 길남은 다시 어금니를 물었다.갈매기가 울며 어둠 속을 지나갔다.
어디에서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던가.어떻게 시작된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된 걸까.내 입으로 말하려 했던 걸 이제는 명국이 아저씨도 안다.그리고 버리라고 했다.여자 끼워서 될 일이 아니라고 했다.
『내 마음은 말이다.』 길남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널 버리지도,그렇다고 함께 가지도 못하겠다는 거야.
이 심정을 넌 모른다는 거니.』 『그럼 버려.버리고 혼자 떠나.』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