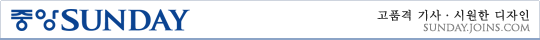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내기 당구를 하면 따는 건 당구장 주인뿐’이란 우스갯소리가 있다. 지난해 펀드 가입자들의 처지가 꼭 그랬다. 주가 하락의 위험을 무릅쓰고 1년 내내 주식형 펀드에 돈을 묻어둔 사람들이 올린 수익률은 1.04%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펀드를 판매한 은행ㆍ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가져간 판매ㆍ운용 수수료는 2.5%에 달했다. 투자한 사람 따로, 재미 본 사람 따로였던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각각 펀드 판매망의 70%와 30%를 차지하는 은행과 증권사가 지나치게 많은 판매 수수료를 떼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5년 2986억원이던 주요 은행들의 펀드 판매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6096억원으로 두 배가 됐다. 김재칠 증권연구원 연구원은 “국내 주식형 펀드는 판매 수수료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 장기투자를 할수록 불리한 구조”라며 “펀드 수퍼마켓이나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돼 수수료가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억 투자하면 243만원 떼간다=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투자 잔고의 2.15%에 달한다. 판매회사가 1.39%, 운용사와 수탁회사가 각각 0.73%와 0.07%를 떼간다. 1억원을 투자하면 판매사에 130만원, 운용사와 수탁회사에 각각 73만원과 7만원을 해마다 주는 셈이다. 이뿐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추가된다. 운용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수수료나 보고서 작성 비용 등 이런저런 관리비용이 모두 펀드에서 빠져나간다. 이 비용이 평균 0.28%, 투자액이 1억원이라면 28만원이다. 결국 주식형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하면 해마다 평균 243만원씩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요즘 같은 상승장에선 실제 빠져나가는 금액이 이보다 더 많다. 불어난 원금을 기준으로 매일 수수료와 비용을 차감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수료가 2.2%인 펀드에 1억원을 넣었다면 다음날 이 비율을 365일로 나눈 0.00603%에 해당하는 6030원을 떼간다. 주가가 두 배로 올라 잔고가 2억원이 됐다면 수수료도 1만2060원이 된다. 더구나 이 돈은 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금요일 기준가를 기준으로 꼬박꼬박 빠져나간다. 복리, 그것도 날마다 이자를 내는 일수 복리인 것이다. 이 때문에 펀드 투자설명서에서 예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게 보통이다.
■장기투자할수록 불리=문제는 펀드 종주국인 미국에 비해 이 같은 수수료율이 턱없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의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수료는 1.15% 안팎으로 국내보다 1%포인트가량 낮다. 연 1%가 무슨 대수냐고 여기면 큰 오산이다. 복리효과 때문이다. 1억원을 연 10% 수익률로 10년간 투자한다고 하자. <그래픽 참조> 국내 주식형 펀드처럼 연 2.43%의 비용을 떼면 10년간 들어가는 돈이 모두 3573만원에 이른다. 이를 뺀 원금과 수익은 2억554만원으로 투자수익률이 105%가 된다. 비용이 1.43%로 낮아지면 빠져나가는 돈이 2216만원으로 훨씬 줄어든다. 대신 원금과 수익은 2억2622만원(수익률 126%)으로 크게 불어난다. 비용 1%포인트 차이가 10년 뒤 20%가 넘는 수익률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수수료 구조도 불합리하다. 국내 펀드는 거의 모두 투자기간에 상관없이 해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떼고 있다. 미국에선 가입 때 판매 수수료를 한번 받고 투자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식형 펀드인 피델리티의 마젤란펀드처럼 자동응답전화나 인터넷으로 팔면서 별도의 판매보수를 받지 않는 펀드도 많다. <표 참조>
■낡은 구조 바꿔야=전문가들은 펀드 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운용사보다 많은 판매보수를 해마다 가져가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펀드 판매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이들은 대개 연 수수료의 70%가량을 가져가고 있다. 판매채널을 유지하고 가입자를 관리하는 비용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펀드 가입자들은 운용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받을 뿐 은행ㆍ증권사로부터는 편지 한 장 받아본 적이 없다. 자산운용사들은 “판매채널 독점에 따른 횡포”라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전엔 환매가 들어올 경우 판매사가 우선 자기 돈을 내주고 주식을 떠안았기 때문에 주가 변동 위험에 노출됐고 그래서 판매사 수수료가 높게 책정됐던 것”이라며 “제도개선으로 이런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지금도 판매사가 계속 높은 수수료를 갖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에선 펀드 가입자가 최초 한 번만 판매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현철 기자




![[오늘의 운세] 5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