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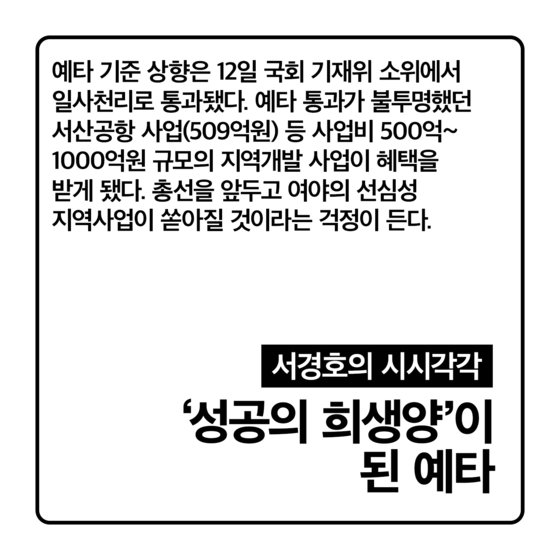
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 지역 민원 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쏟아내는 ‘재정의 정치화’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9~2019년 예타 덕분에 나랏돈 144조원을 절감했다고 추산했을 정도다.
예타의 활약이 커지면서 예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보수·진보 정권 모두 짬짜미한 것처럼 비슷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쳤다. 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욱여넣었다. 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에 속해 예타가 면제됐다. 4대강 사업은 최근 가뭄이 심해지면서 긍정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사하는 식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했다면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예타
재정의 정치화 막았지만 저항 많아
면제 최소화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문재인 정부도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사업비 4조6562억원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도 면제 혜택을 받았다. 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1조원)와 박근혜 정부(25조원)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 문 정부는 2019년 예타 제도를 고쳐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올렸다. 그 결과 비수도권 SOC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제도 개편 전 52%에서 개편 후 89%로 대폭 상승했다.
이런 지경이니 세계은행 전문가로부터 “(한국의) 예타가 ‘성공의 희생자(victim of its own success)’가 됐다”는 말까지 듣는 거다. 예타가 제 역할을 잘하니 지역과 정치권의 저항이 심해졌고, 예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 예타 절차 도입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조정(500억→1000억원) 등을 발표했다. 예타 기준 상향은 12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예타 통과가 불투명했던 서산공항 사업(509억원) 등 사업비 500억~10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기재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호화 청사처럼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우려가 큰 건축 부분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에서 빠져 있어서다.
예타 기준 상향은 다른 정부 부처가 환영할 것이다.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다 기재부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어서다. 예타 도입 전에는 각 부처가 스스로 타당성조사를 했다. 1994~98년 완료된 타당성조사 33건 중 32건이 ‘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냈다. 부처나 지자체의 자기 사랑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예타가 중요하다. 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 현실적으로 예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실 법령 어디에도 예타 결과를 반드시 지키라는 조항은 없다. 예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라고 강제할 뿐이다. 물론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을 추진할 강심장은 없겠지만 말이다. 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
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 재정준칙이 경제 위기 시 정부 대응에 족쇄를 채울 것이라는 비판은 정확하지 않다.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 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재정의 방만 운용을 막는 고삐가 될 것이다.
글 = 서경호 논설위원 그림 = 안은주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