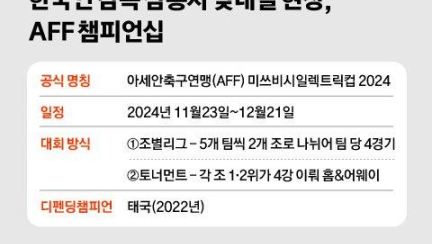사업은 누가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고 아버지는 생각했다. 부산의 재래시장에서 메리야스 장사로 시작, 부산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염색공장 사장이 된 그였다. 그래서 아들도 자신처럼 실패를 겪어 봐야 한다고 여겼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자기 밑으로 불러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혼자 장사를 시작해보라고 떠밀었다. 아들은 속옷 판매업, 대기업 하청 봉제업체 등을 하며 숱한 고생을 했지만 사업을 접고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아버지 만큼 할 수 있을 것'이란 오기 때문이었다. 결국 아들은 165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이지캐주얼(기본 스타일을 기초로 남녀노소가 가격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옷) 시장 1위의 의류업체를 세웠다. 바로 '베이직하우스'다.
우한곤(63) 회장-우종완(41) 사장 부자(父子). 이들에겐 요즘 경사가 겹쳤다. 지난달 5일 우 회장이 정부로부터 국민포장을 받았다. 남들 모르게 30여 년간 결손 아동 등을 도와왔던 공을 인정받았다. 최근엔 붉은 악마로부터 의뢰를 받아 만든 'Reds, go together'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토고전 다음 날인 14일 이 티셔츠 판매량은 100만장을 돌파했다. 단일 제품으로는 의류업계 사상 유례가 없는 기록이다.
경북 경주가 고향인 우한곤 회장은 1950년대 후반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장사를 배우겠다"며 부산 국제시장으로 갔다. 가정 형편 때문에 그나마 중학교 3년도 선교 재단에서 대준 학자금으로 다녔다. 우 회장은 대대로 양반 집안이었다. 15대 조부는 예조판서도 지냈다.
그러나 집안은 대대로 가난했다. 학자였던 증조부의 제자들이 조그만 땅을 사주기도 했지만 가족들 입에 풀칠하기에도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어릴 적부터 '먹고사는 데 글은 소용없다'고 여겼다. 일찌감치 진학을 포기한 것도 그런 생각에서다. 시장에서 일을 배우다 스물세 살 되던 해 처음으로 시장 한 귀퉁이에 가게를 냈다. 소매업에서 도매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고 원단을 생산하는 일흥염직을 차려 연매출 50억원 수준의 기업으로 키워냈다.
처음엔 아들 우 사장이 자기 일을 물려 받기를 바랐다. 그래서 아들을 부산대 섬유공학과에 보냈다. 이렇게 해 의류업과 연을 맺게 된 우 사장은 졸업 후 곧장 아버지의 회사로 들어가지 않았다. 당시 의류업을 대표하던 태광.태창에서 1년여간 일하다 1991년 자신의 사업체를 차렸다. 의류 완제품을 만들어 해외의 유명 브랜드에 납품하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였다. 그러다 2000년 자체브랜드를 만들기로 했다. 중국산 등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OEM 시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우 사장은 그해 말 부산에 베이직하우스 첫 매장을 냈다. 그리고 3년 만에 전국적으로 150개의 매장을 만들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의 예상대로 중저가 이지캐주얼 시장에 대한 수요는 대단했다. 2001년 245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1645억원으로 일곱 배 가까이 뛰었다. 베이직하우스는 순식간에 업계 1위 자리에 올랐다. 이 회사는 베이직하우스 외에도 볼.마인드브릿지 등 3개의 브랜드를 거느린 번듯한 의류업체로 성장했다.
숱한 시련도 있었다. OEM 사업 시절 대량 주문 고객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는 통에 회사가 휘청거리기도 했고, 베이직하우스 설립 후엔 대리점을 내겠다는 사람이 없어 직접 매장을 찾아나서기도 했다. 형편이 어려워져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면 우 사장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매번 필요한 자금을 채워 주면서도 우 회장은 결코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식으로 다그치지 않았다. '사업가로서 실패만큼 좋은 경험이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이 우 사장을 보고 '2세 경영인'이라 했다. 아버지의 직책이 회장이고 아들이 사장이니 그렇게 여긴 것이다. 그러나 우 회장은 "베이직하우스는 전적으로 아들이 만든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은 단지 직책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그는 오히려 아들을 "나보다 안목이 좋은 훌륭한 경영인"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정작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다"며 겸손해했다.
글=김필규 기자 <phil9@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자 <cogit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