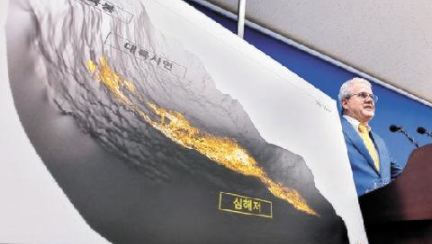미국이 우리 정부에 이라크 치안유지를 위해 파병을 요청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이라크전 종결 이후의 재건 사업이 최근 잇따라 터진 대형 테러사건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치안유지 병력 증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라크에는 미국.영국.호주군 등 16만3천명이 주둔하고 있으나 미국은 3만명 정도의 추가 병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왔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타진해 온 파병 규모는 명확지 않다. 최근 한.미동맹 조정회의 참석차 방한했던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사단급(1만여명)과 여단급(3천~7천명)을 함께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현재 이라크에 파병 중인 다른 나라에 준하는 수준을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이라크에는 영국군이 1만여명으로 외국군 가운데 가장 많고 나머지 국가의 경우 1천~2천명이 파견돼 있다. 하지만 미국이 추가 파병을 요청한 동맹국 가운데 한국군의 지상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에 비춰 미국 측 메시지는 여단급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파병 부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투병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일 테러가 일어나고 게릴라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파병 요청 인원이 대규모인 데다 전투병이 대상인 만큼 정부의 파병 결정 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4월 의료.공병부대 파견 때보다 진보단체들의 반발이 더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시는 전투가 종결된 시점에서 후방지원 업무를 맡았지만 이번에 파병을 하게 되면 전투도 예상되는 치안유지 임무를 맡게 되는 만큼 인명 피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다.
그런 만큼 정부는 한.미동맹 관계와 국민 여론 사이에서 적잖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파병 반대파들이 현 정부 지지세력일 가능성이 큰 점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점은 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4월과 달리 부시 행정부가 미.영 연합군 중심이 아닌 유엔 평화유지군 차원의 파병을 모색하는 점은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에 파병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추가 파병은 이라크 재건사업 지분을 늘려줄 수도 있다.
오영환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