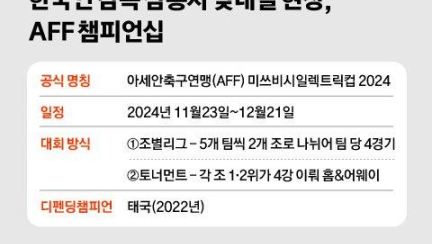기고 민경천 축산자조금연합 회장
축산농민들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2014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는 일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일이 이제 100일이 채 남지 않았다.
정부가 부여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은 3년. 이 시간을 온전히 다 써도 모자랄 판국에 정부는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에서야 세부 실시요령을 내놓았다. 4개 부처(환경부·농식품부·국토교통부·행안부)의 합동 서신이 지자체에 전달된 것도 불과 한 달 전 일이다. 정부의 늑장 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들의 시계는 허망하게 흘러가고 있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를 환경·수질오염의 주범이라 치부하며 우리 농민의 생존을 위협해오고 있다. 하지만 무허가 축사는 축사 건물 전체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 액비, 정화)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다. 농가가 분뇨를 무단 배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등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이미 엄격한 행정 체제를 갖추고 있다.
우리가 어린아이 떼쓰듯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간 연례행사처럼 발생해온 가축 전염병(AI, FMD 등)의 발생일수는 총 325일, 약 11개월에 달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농민들은 적법화 시행을 따르고, 또 축산업을 지키고자 했다.
하지만 적법화는 가축분뇨법뿐 아니라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 등 20~30여 개의 법률에 얽혀있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측량·설계비 등 과다한 비용 부담이 뒤따른다. 이미 건축법에 따라 인허가된 적법화 축사임에도 GPS 측량 도입으로 실제 측량과 차이가 발생, 적법화가 불가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생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축사를 증·개축한 경우의 대책도 제외되는 등 제도적으로 적법화가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 정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다.
몇몇 소규모·고령농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폐업을 택했다. 많은 농민이 축산현장을 떠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대로 행정처분을 강행해놓고 적법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축산농가에 묻는다면 농민들에게 더이상 봄은 없다.
축산업은 우리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다. 농촌 지역 지자체의 총생산액 중 약 60%를 차지하고, 또 유일하게 가업을 상속해오고 있는 축산업이 붕괴된다면 고령화의 가속페달을 밟는 격이다. 생산뿐만 아니라 도축, 유통, 가공, 판매 등 관련 산업 규모가 60조에 달하고, 이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것이다.
축산업 붕괴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국내 자급률 하락으로 수입육이 우리 시장을 장악하면 식량안보는 위협받게 될 것이다. 올해 AI 사태를 되돌아보자. 계란값은 80~90% 폭등했다. 지난 2011년 FMD 발생 시에도 돼지고기가 산지 가격의 110%(3500원→7500원/kg)를 웃돌았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또 적정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허나 일례로 재래시장의 지붕가림막에 대한 적법화 조치를 엄격한 법의 잣대에 기대어 진행했다면 시장상인들은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 축산 농민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뼈를 깎는 고통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처우다.
우리는 정부와 지자체도 갈팡질팡 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연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축산 농민에 생존권을 보장해주길 강력히 주장한다. ‘환경개선’이라는 간판을 앞세워 실상 농민들을 궁지로 몰고 있는 정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빨리빨리’를 외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환경개선일까 아니면 우리 축산업의 몰락일까.



![[오늘의 운세] 5월 1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