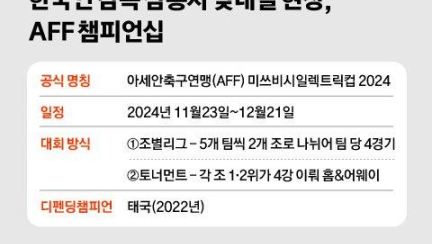이훈범
논설위원
1945년 4월 중순의 어느 날 러시아군이 독일 베를린 코앞까지 밀어닥치자 히틀러의 참모들은 베를린을 떠날 것을 권했다. 항복을 주장하는 측근들은 모두 제거됐지만 패전을 생각하지 않는 참모는 아무도 없었다. 베를린을 포기하자는 것도 전열을 재정비해 반격을 노리는 작전상 후퇴가 아니었다. 나치 수뇌부가 베를린에 남아 있으면 러시아군의 집중포화를 면할 수 없기에 국민들의 희생만이라도 최소화하자는 얘기였다.
하지만 히틀러는 제안을 단칼에 잘라 버렸다. 대신 베를린 사수를 명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독일군은 고장 나 움직이지 못하는 탱크의 포탑을 땅에 묻고 대포로 써야 했다. 이런 자조가 절로 나왔다. “방어선이 뚫리는 데 1시간 걸릴 거야. 러시아군이 55분 동안 포복절도하고 5분 만에 끝내버릴 테니까.” 예상대로 러시아군의 강력한 포격이 시작됐다. 며칠 동안 퍼부은 폭탄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내내 연합군이 베를린에 투하한 폭탄보다 많았다. 이 포격으로 2만2000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청와대의 대통령 관저가 히틀러의 지하벙커와 닮은꼴로 보이는 게 나뿐만은 아닐 터다.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고함이 천지를 흔드는데 청와대는 고요하기만 했다. 150만 개 촛불이 청와대 앞을 밝힌 지난 주말 저녁,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 건물은 불이 꺼져 있었다. 참모들이 어떤 조언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청와대 사수를 지시하는 듯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인사 발표가 이어져 나왔다. 앞서 내놓은 인사들로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나라가 더욱 어지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대통령이 어제 마이크를 잡았다. 마지막 담화라 해서 이제 지하벙커에서 나오나 싶었다. 그런데… 모두 내려놓았다는데 뭘 내려놓았는지 모르겠다. 잘못했다는데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다. 여야는 물론 여권 내에서조차 뭐 하나 합의가 어려운 국회 상황을 이용한 꼼수 말고는 달리 드는 생각이 없었다. 정말 내려놓겠다면 담화 첫 문장을 변명 아닌 사퇴로 시작해야 했다. 국민들의 퇴진 요구에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이 한 말은 이 한마디였다. “Je quitte(나 갑니다)!”
![[일러스트=김회룡]](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611/30/htm_2016113014428792106.jpg)
[일러스트=김회룡]
벙커 속의 히틀러는 절망 속에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의 출현을 기대했을지 모르겠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주인공을 (사실은 벌여 놓은 이야기를 수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극작가를) 뜬금없이 나타나 구해 주는 ‘기계장치의 신’ 말이다. 하지만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이 아닌 히틀러가 구원받지 못했듯 현실 인물인 대통령도 그런 기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기계의 신은 고작 탄핵이 부결되거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임기를 채울 수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말 위태롭다. 가장 큰 우방인 미국에서 전대미문의 정권이 출범을 앞둔 참이다. 경제는 노벨 경제학상을 탄 석학도 해법을 찾기 어려운 내리막길이다. 북한의 핵 도발은 갈수록 도발적이고 공교해지고 있다. 이런 때 지지율 4%의 대통령이 임기를 고집하는 건 국민들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일 뿐이고, 누가 이기든 그 피해자는 국민들일 뿐이다. 히틀러는 그래도 적과 싸웠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과 싸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말마따나 그러려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닐 텐데 말이다.
히틀러는 “지금 항복하면 게르만족은 절멸되고 만다”고 외쳤다. 하지만 게르만족은 그때 항복했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무기 대신 평화를 들고 새로운 전성시대를 맞아 유럽을 이끌고 있다. 사라진 건 히틀러의 이름뿐이다. 독일에서 흔한 남자 이름이던 아돌프는 이제 누구도 짓길 꺼리는 폐명(廢名)이 됐다. 우리 대통령이 따라야 할 예는 그런 히틀러가 아니다.
배울 예는 따로 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남군의 영웅 로버트 리 장군이다. 1865년 4월 9일 리 장군이 이끄는 노던버지니아군은 아포마톡스 법원 근처에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압도적 북군 병력에 포위됐다. 충직한 부관 포터 알렉산더 장군과 함께 통나무에 앉아 숨을 돌리던 리 장군은 “항복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알렉산더는 반발했다. “병사들에게 숲으로 달아나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남은 병력의 3분의 2 정도는 흩어져서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리 장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될 말이지. 남부동맹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명예롭고 타당한 일은 무조건 항복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오. 병사들도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농작물을 심고 전쟁의 피해를 복구해야 합니다.”
남북전쟁에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추앙받던 리 장군은 항복함으로써 평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다. 만약 그가 게릴라전을 선택했다면 심각한 분열과 혼란으로 미국이 오늘날 같은 강대국이 될 수 없었을지 모른다. 대통령 앞에 남아 있는 것도 리 장군의 선택밖에 없다. 그것이 마지막 남아 있을 애국심의 실천이다. 그러지 않으면 촛불이 곧 횃불로 바뀌게 될 터다. 대통령의 화상이야 자업자득이지만 공연히 손을 델 국민들이 안타까워 하는 얘기다.
이 훈 범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