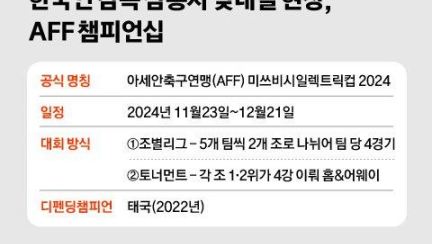90년대에 가서야 손을 쓸 생각이었던 물질특허문제가 당장 발등의 불로 다가섰다. 미국은 저작권과 함께 1년의 시한을 붙여 구체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물질특허는 사실 용어부터 생소하다. 시비가 일기 시작하자 지난9윌 부랴부랴 관련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불질특허민간협의회」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다. 실태파악조차·제대로 시작 못한 상황에서 미국 측이 보복을 전재로 한 물질특허 침해여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들고나선 것이다.
우리의 현행 특허제도는 제법특허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물질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요컨대 외국기업이나 연구소가 많은 돈을 들여서 화학물질을 발명한 것을 사용료(로열티)를 제대로 물지 않고 베껴서 만들거나 편법으로 헐값에 사들여왔다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이다. 우리보다 훨씬 공업수준이 앞섰던 이탈리아와 스위스도 78년에야 비로소 물질특허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물질특허와 관련되는 업계는 제약·농약·화장품 등 정밀화학분야와 최근 각광을 받고있는 유전공학까지 포함된다.
이들 관련업계가 물질특허인정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로열티 등의 추가부담만 있을 뿐 우리측이 보호받을 만한 물질특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물질특허를 일단 인정하고 나면 지금까지 국내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주력해온 제법개발위주의 연구사업은 근본적인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 신물질에 대해 특허가 인정되는 즉시 그와 관련된 독자적인 제법개발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물질특허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경제적인 추가부담이 금방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약품의 경우는 특허출원에서 임상실험·제조허가 등에 10년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물질특허도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대체로 10년 이후부터 생겨난다고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농약은 5∼6년 이후부터, 기타정밀화학 제품은 4∼5년 이후부터 실질적인 추가부담이 생겨나게 된다.
의약품의 로열티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보자. 전체 의약품 중에서 물질특허에 해당하는 경우가 5%, 로열티가 10%라고 가정하여 전체 의약품 생산규모 1조2천5백억원(83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백만달러(62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생겨난다.
이런 식으로 추정해보면 물질특허 부담이 90년대 중반에 가서는 연간 약 2천만∼3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해외협력위원회는 예상하고있다. 여기에다 저작권까지 합치면 4천만∼5천만달러 규모가 된다.
이 같은 추가부담이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협력위원회나 상공부 측은 미국 측의 요구대로 물질특허 도입을 87∼88년으로 앞당기는 쪽으로 태도를 굽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제까지고 버텨낼 수 없지 않느냐는 일반론에다 보복을 전제로 밀어붙이는 미국 측의 압력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결국 섬유·철강·전자·신발 등 굵직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등으로 보복을 당하느니 물질특허 도입을 앞당겨주는 것이 전체 득실 면에서는 낫다고 판단하고있는 것이다.
물론 물질특허를 당장 인정한다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규특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우리 나라에서나 외국에서 이미 편법으로 로열티를 내지 않고 싼값에 생산하고 있는 물질은 특허제도도입에 상관없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특허 도입시기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당장의 추가부담이 얼마냐는 문제가 아니라 국내산업의 기술 및 연구개발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특허의 조기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그로 인해 한국에 투자를 꺼리던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고 기술이전이 촉진될 경우 연간 11억달러에 이르는 정밀화학제품의 수입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측은 물질특허를 도입할 경우 자칫 선진외국 기술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능력으로는 신물질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비용과 연구수준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한 물질특허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컴퓨터·소프트웨어부문은 미국 측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것을 저작권·물질특허·특별법 제정 중에 어떤 것에 적용시켜야하는지 조차 국제적으로도 모호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장규기자>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