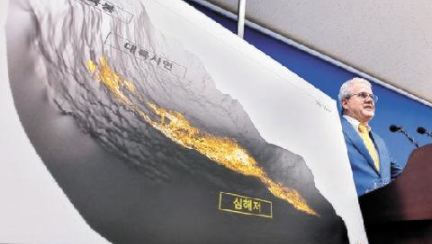지난해 한·일 월드컵을 통해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이 얻은 성과 중 하나는 '미드필드 장악없는 승리는 없다'라는 사실을 체득한 것이다. 한국은 지난 4월 16일(서울)과 지난달 31일(도쿄) 두 차례 한·일전을 통해 그 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바로 두터워진 허리에서 나오는 힘이다.
▶월드컵 이전=1999년 9월 허정무 감독이 이끌었던 올림픽대표팀은 일본과의 원정(7일)·홈(27일) 두 경기에서 모두 패했다. 특히 원정 첫 경기는 1-4라는 치욕적인 스코어였다. 일본은 한국의 미드필드를 유린하며 공간을 확보해갔다. 한국은 빈 공간을 향해 나가는 일본의 패스에 속수무책이었다.
2000년 4월 26일 잠실에서 벌어진 국가대표 간 한·일전에서 한국이 1-0으로 승리했고, 월드컵 전 마지막 한·일전(2000년 12월 21일·도쿄)에서는 1-1로 비겼다.
그러나 내용은 미드필드에서 일방적으로 몰리다가 탁월한 공격수들의 결정력 때문에 겨우 이기거나 비긴 것이었다.
▶월드컵 이후=월드컵 전후로 대표팀에서는 '히딩크 황태자'가 양산됐다. 송종국·박지성·김남일·이을용 등은 움베르투 코엘류 감독 체제까지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미드필더라는 점이다. 히딩크 감독은 이들에게 '공간 개념'과 '어떻게 미드필드를 장악할지'를 가르쳤다. 어느 새 대표팀에는 "미드필더 감이 없다"는 옛말이 사라졌다.
1차 한·일전에는 안정환(공격형)·김도근·유상철(이상 수비형)이 미드필더로 나섰다. 경기 막판 어이없이 한골을 내줘 패했지만, 한국은 경기를 지배했다.
2차 한·일전에서는 유상철(공격형)·이을용·김남일(이상 수비형)이 출전했다. 이들은 철저한 역할 분담(유상철-공격, 이을용-공·수 연결, 김남일-수비)을 통해 중원을 장악했고, 공·수의 출발점이 됐다. 여기에 이영표·송종국까지 좌·우에 가세한다면 월드컵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탄탄한 허리가 구성된다.
장혜수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