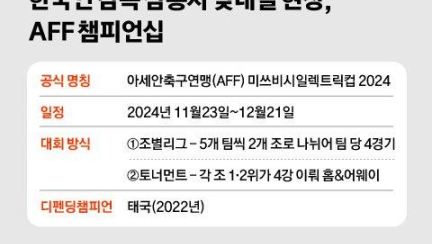백기완을 예전부터 알아온 김지하와 나 또는 훨씬 후배들인 채희완.김정환 등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 얘기하지만, 그가 나중에 민중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던 것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물론 '문화운동'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정립된 뒤의 얘기였지만 사회변혁 운동에서 혁명적 전투상황이 아닌 이상은 모두가 문화를 통하여 대중과 만나기 마련이다. 백기완이 그전 모습으로 늙어갔다면 그야말로 문화운동의 태두요, 거목이 되었을 거라고, 그는 민족의 광대라고 모두 아쉬움 섞어서 말한다. 백기완의 대중 강연 솜씨라든가 그 번뜩이는 상상력이나 젊었을 적의 기개는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 예전부터 그의 연구소에는 동네 사랑방처럼 난다 긴다 하는 젊은 것들이 모여들어 그의 푸짐한 객설을 들었는데, 모두 그의 말에 대하여 이의는커녕 언제나 잘못을 지적받고 얻어 터지거나 벌을 서곤 했다. 박태순이나 김도현이가 술자리에서 어려운 말을 쓴다고 어쩌다 학술용어를 외래어로 말하자 대번에 귀싸대기에 벽을 향하여 서 있도록 했다. 김남주가 잘 부르던 십팔 번인 '찾아갈 곳은 못 되더라 내 고향' 하는 식민지 시대 유행가가 있었는데 끝 구절의 가사가 '똑딱선 프로펠라 소리가 이 밤도 처량하게 들린다' 였는데, 아마도 작사가는 배의 스크루라는 기계를 미처 몰랐던 모양이다. 끝 구절의 가사가 나가자마자 백기완의 호통과 귀싸대기.
-이놈아, 누가 외래어 쓰라구 그래서?
-아니 그럼 프로펠라를 뭐라구 합니까요?
-바 람 개 비.
그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똑딱선 바람개비 소리가'라고 고쳐서 부르게 된다.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아마 내가 해남에 내려가 있을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부산에서 기독교협의회가 현장 운동을 하는 일꾼들을 불러 모아다가 연수회를 열었던 때였다. 백기완과 나, 그리고 대학가에 탈춤을 보급했던 채희완이도 참가자 겸 강사로 따라 내려갔다. 모임이 끝나고 경부선 열차를 타고 셋이 상경하는 길이었는데, 백기완은 흥이 났던지, 우리 둘을 감화시켜야겠다고 작정했는지 장광설을 펴기 시작했다. 채희완과 나는 당시의 시쳇말로 '지방 방송 라지오 끄고' 입을 헤 하니 벌리고 그의 황해도 억양 섞인 객설에 도취했다.
-야야 문화가 머이냐. 거 따루 따루 노는 거이 아니야. 거 다 사는 거 하구 한 보따리에 같이 노는 거이야. 너이덜 두드리는 징은 그거이 징이 아니야. 깡통소리하구 머 다를 거이 이서. 쟁쟁쟁 하디. 저어 황해도 구월산 아래 나무리벌 어루리벌 가없는 들판 가운데 먹구 살만헌 동네들이 있디. 동네마다 대대로 수백 마지기 가진 지주집이 있기 마련이라. 너른 마당 우물가에 싸리 울타리가 있디. 그 울안 깊숙한 데 한아름들이 놋요강이 숨게제 이서. 지주집 마누라년 궁둥이가 쌀가마만해. 그 궁둥짝 올려놓고 천둥번개 방구 뀌고 한 자배기씩 싸제끼고 오줌 한 번을 누면 오뉴월 쏘나기가 한바탕 지나가. 아침마다 씨종년이 그 요강을 내다가 물 부어 가시고선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닦아 정갈한 물 한가득 채워선 싸리울 속에다 감춰 놓는 게야. 그걸 백중날 머슴놈들이 노려.
그림=민정기
글씨=여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