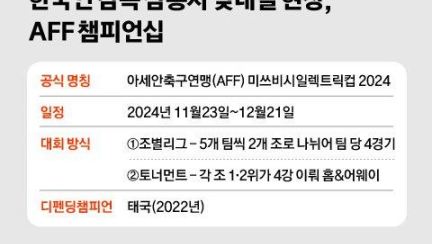남편의 출장핑계로 느긋하게 늦잠을 자고 막 일어나려는데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시의 전홥니다.』
출장 중인 남편이 밤새 안부를 묻는 전화인가 했더니 전혀 뜻밖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나야 나. 지금 여기는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양평에 사는 친구의 전화였다.
눈이 온다는 말에 커튼을 젖히고 창 밖을 보니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다.
『여기도 눈이 오려나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화했니?』
나는 이렇게 물어보고는 생활에 찌들어 버려 주접 들린 여편네 같은 심드렁한 내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평평 쏟아지는 흰눈은 이미 나완 무관하게 느껴진 것에도,
『어머, 네가 여기 안와봐서 그렇지 너무 멋있어. 온통 눈으로 뒤덮여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기분이야.』철없는 어린애처럼 깔깔거리는 친구의 음성에 잠이 다 달아나 버렸다.
『난 지금부터 집안 치우려고 그러는데 넌 집이나 다 치우고 이 야단이니?』
『시골에선 지금 대낮이야. 집안 일 끝낸 지가 언젠데? 이제부터 점심 밥지을 준비해야 되고 애들도 봐야되고 한가할 틈도 없는데 눈이 오니까 괜히 들떠서 전화 해본 거야.』
한 시간쯤 걸어나와야 서울 오는 버스가 있으니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금세 뛰어 올 수도 없는 곳에 사는 친구.
거기다가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어머니 층층시하에 외며느리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밥만 하다가 만다고 투덜거리다가 훌쩍 시골로 가버린 그 친구의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벨기에로 유학 가는 남편을 따라가서는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나라에서도 간호원을 해서 시어머님께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드렸다는 소식을 들었었다.
또 귀국해서는 그 흔한 아파트에 갈림도 펴보지 않고 시골집으로 곧 장 내려가서 불을 지펴서 밥을 짓는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나와 다른 친구들은 그 애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쳐다보았다.
우리는 특히 층층히 계신 시댁어른들에 초점을 모으고 스트레스 운운하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우울할 땐 냇가에 가서 빨래를 꽝꽝 두들기며 노래를 불러. 그래도 애들이 숲 속을 헤치고 작은 동산을 오르며 제 손으로 땅콩나무를 심는 걸 보면 시골에서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소리 없이 웃으며 이런 말을 하는 이 친구를 한세기전쯤의 여인네로 여기며 신기한 눈초리로 보았었는데·….
갑자기 온 산이 흰눈으로 뒤덮인 시골의 찬 공기 속에 서 있을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다. 반면에 나는 먼지가 별로 없어도 어딘지 탁한 도회에 오염되어 눈이 와도 별 감흥도 못 느끼는 여자가 된 기분이 들었다. 그제서야 창밖에 가는 눈발이 떨어지는데, 이날 따라 이 도시에 오는 눈은 분에 넘치는 은총같이 느껴진 것은 웬일일까? <서울 석포구 망원동239>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