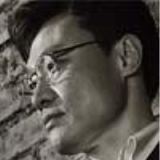이규연
이규연논설위원
빅파이(BigFi). 무료로 공개되는 대용량 정보를 뜻하는 신조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때 내세운 ‘빅파이 프로젝트’에 등장한 용어다.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전면 개방해 창업을 지원하고 주민의 행정편의를 높이겠다는 공약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 3.0’의 취지와 비슷하다. 모든 디지털 흔적이 실시간으로 남는 스마트사회에서 빅파이는 새로운 산업이나 행정의 ‘원자재’일 뿐만 아니라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2008년 11월 구글은 독감 경보시스템을 발표했다. ‘플루(flu)’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시간을 두고 독감이 유행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검색어를 활용해 독감 전파경로를 추적하고 대유행의 가능성을 내다봤다. 최근 구글의 예측이 그리 신통치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보건당국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구글은 독감에 이어 돼지인플루엔자 경보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빅파이로 내일의 위험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이를 시도한 ‘넘버 원’은 싱가포르다. 신종역병·기후변화·테러·침투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는 국가다. 10년 전인 2004년, 싱가포르 정부는 기발한 생각을 해낸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면 위험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총리실 산하 국가안보조정사무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위협요소를 빠르게 탐지하는 프로그램(RAHS)을 가동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 함께 해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측시스템을 구축했다. 인터넷검색어·휴대전화통화량·SNS동향 등 미세한 ‘디지털 그림자’를 기반으로 해상테러나 해안침투가 벌어질 수 있는 지점을 찾아냈다. 비슷한 방식으로 조류독감의 위협수준을 알아채는 시스템도 선보였다. RAHS 프로그램 책임자인 추 락 핀이 한국에 왔다. 18일 열린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전략센터 개소식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 빅데이터로 미래예측이 가능한가.
“신호가 약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미처 예상치 못한, 떠오르는 이슈를 발견하게 된다.”
- 요즘에는 무엇을 주시하나.
“범죄·테러는 변하지 않는 테마다. 오픈소스 운동, 해커, 바이오기술, 3D프린팅 기술의 위험성도 주시하고 있다.”
- 빅데이터는 다가올 사회에 어떤 존재인가.
“장래를 내다보고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한 도구다. 하지만 빅데이터 자체가 새로운 골칫거리를 야기하기도 한다.”
빅파이의 중요 성분은 개인의 세밀한 기록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공공데이터 공개를 놓고 사생활 침해 논쟁이 벌어진다. 역시 현장에서 영국 오픈데이터연구소 디렉터인 리처드 스털링을 만났다. “영국에서도 논쟁적 이슈다. 우리는 2년 전 개인정보를 선별적으로 걸러내고 공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남경필 지사 같은 지방정부 수장이 관심을 가지면서 빅데이터 활용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일의 전략을 수립하고 위협요소에 대응하는 중심체가 되겠다”고 미래전략센터 출범의 의미를 설명했다. 장 원장의 말대로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높은 대한민국의 특성을 잘 살리면 빅데이터 분야의 선도국이 될 수 있다. 혁신적 생각과 윤리만 있다면 ….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디지털신호를 주고받는 세상에서 빅파이는 갈수록 커진다. 이제 우리 사회는 숙제 하나를 더 받았다. 잘 풀면 경제위기와 재난에 맞설 힘을 얻는다. 반대면 쓰레기 데이터에 둘러싸여 사생활만 몽땅 털리는 신세가 된다. 과연 빅파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빅파이는 데이터일 뿐이다. 선택은 항상 우리가 한다.
이규연 논설위원




!["10점 만점에 11점"…英 독설 심사위원 놀래킨 '3분 태권 무대' [영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6/2b284bb2-8e01-43b7-8a9e-8da5c241b0ea.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