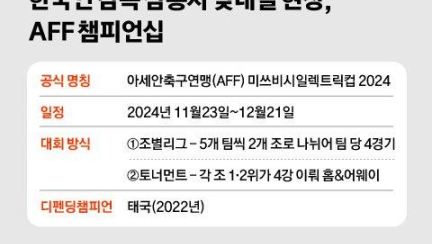『시조창에도 인본 사상이 깃 들어야 합니다. 자기 소리로써 자기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시조 읊기지요.』
78년 전국 시조 경창 대회 을부에서 5등, 79년도에는 3등을 차지한 예당 이필윤씨 (50·서울 용두동)는 간단한 선율의 시조 한 수를 읊더라도 정관의 세계, 선의 경지를 펼쳐가야 비로소 시조창의 문전이 이른다고 했다.
물보다 산을 좋아하는 이씨는 2년 전부터 매일 새벽 5시에 기상, 고려대 뒤 개운산에 올라가 아침 체조 대신 1시간 동안 시조를 읊는다.
『옛날부터 소화가 안 될 때는 시조 3수만 하면 트림이 난다는 말이 있지요.』 배에다 힘을 준 채 뱃속 깊숙한 곳에서 소리를 자아올리는 동시에 목 머리에서 소리를 흡축 하기 때문에 자연히 단전 호흡이 돼 건강에 좋다고 주장한다.
계룡산 기슭에서 자란 이씨는 어른들이 시조 읊는 것을 눈여겨봐 왔지만 그동안 생활에 쫓겨 공부할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5년 전 시조 경창 대회를 구경 갔다가 완전히 매료돼 그 자리에서 소정 박기옥씨 (전국 시우 단체 총 연합회 사범)를 스승으로 모셨다.
스승이 부르는 창을 따라 부르기 6개월-. 박도 맞출 줄 알게 되면서 발성연 습을 하러 새벽 산을 찾기 시작했다.
『이 바쁜 세상에 시조는 해서 뭘 하느냐』는 주위의 핀잔도 받았다.
시조창에도 일어나고 (기), 받고 (승), 바뀌고 (전), 끝맺음 (결)이 있다고 한다. 특히 시조창에 격조가 들지 않으면 글자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것.
초장의 첫 구절은 여름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듯이 고요히 창공에 피어오르듯이 고요히 창공에 떠올라, 솔개가 높게높게 날아오르듯이 치솟은 뒤 싸늘한 바람에 잠긴 새벽달처럼 적막하고 처량함에 안기고, 희미한 연기에 가린 아련한 불빛처럼 보일 듯 말듯이 날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종장에 가서는 먼 뱃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뱃노래처럼 흥겹고 우렁차야하며, 마지막에 가서는 튼튼한 반석위로 돌아와 안정하는 격조로 끝맺음을 하게 된다.
『3∼4분 남짓한 짧은 동안이지만 시조 한수를 읊으면서 우주 공간을 종횡으로 소요한 뒤 유유히 자아로 돌아오는 것이 시조창의 묘미입니다.』 이씨는 누구나 노력하면 시조창은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씨가 즐겨 부르는 시조는 남구만의 『동창이 밝았느냐…』와 이정진의 『매아미 맵다 울고…』.
『매아미 밉다 울고/쓰르라미 쓰다우니/산채를 밉다는가/박주를 쓰다는가/우리는 초야에 묻혔으니/맵고 쓴 줄 몰래라.』이 한수에 무더위도 달아난다고 했다.
새벽 공기를 찾아 개운산을 찾는 노인들과 함께 「백수 산인회」라는 시조창 모임을 갖고 있는 이씨는 올해도 시조 경창 대회에 출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봉 기자>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