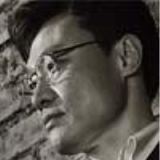이규연
이규연논설위원
16일 서울 시내 모 호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언론포럼을 열었다. 조성경(명지대 교수) 대변인이 추진 일정을 밝혔다. “2016년부터 각 원전에 임시저장 중인 폐기물이 꽉 차기 시작합니다. 연말까지 여론수렴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발표를 들으며 24년 전 충남 안면도 사태의 취재 기억이 떠올랐다.
“천혜절경에 핵폐기물 처리장, 웬 말이냐.”
1990년 11월 초 안면도로 들어가는 연륙교 앞. 수천 명의 주민이 구호를 외치며 화염병상자·기름통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했다. 과격한 일부 주민이 경찰차를 불태우고 팬티 차림의 군청 직원들을 폭행했다. 며칠간 주민이 ‘자치’하는 섬에 갇힌 기자들은 숙식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 사태 초기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적지 않은 주민이 체포됐다. 하지만 주민 대응은 더 거칠어졌다. 과학기술처 장관이 사퇴하고 계획이 백지화하면서 겨우 수습됐다.
6공화국 들어 최대의 농어민 시위사태는 어처구니없는 실수에서 비롯됐다. 과기처 고위공무원이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내뱉은 말이 도화선이 됐다. 안면도 과학연구단지를 만드는데 이 중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5공(共)까지는 국책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혔을 때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면 그만이었다. 시대가 바뀐 걸 모르고 밀실행정이라는 꼼수를 썼다가 이전에 보지 못한 주민 저항을 부른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관(官)이 민(民)의 저항에 봉착했을 때 동원하는 해법은 주로 두 가지다. 공권력에 기대 법적 대응을 하거나, 주민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를 동원하는 방식이다. 안면도 때가 전자였다면 2003년 전북 부안에서는 후자가 쓰였다. 군수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하자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주민투표가 실시되지만 결과는 압도적인 부결로 나온다. 투표 과정에서 유언비어와 회유가 난무하면서 지역주민은 반목했다. 지금까지도 부안에는 그때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
우리는 10만 년간 유독가스를 내뿜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지 않은 채 36년간 터빈을 돌려왔다. ‘배설 없는 섭취’의 허상에 빠져 정화조 없는 주택에서 살아왔다. 안면도에서는 공권력으로, 부안에서는 주민투표로 밀어내기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최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에게서 자신이 펴낸 『사용후핵연료 딜레마』를 받았다. 책에는 사회신뢰도가 높은 스웨덴도 처리장 선정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자세히 소개돼 있다. 스웨덴폐기물처리기구(SKB)는 80년대부터 부지 선정에 나서지만 지역의 반대에 봉착한다. 2009년 최종 부지가 선정될 때까지 30여 년간 1만1000차례 지역주민과 대화하고 나서야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이들이 쓴 해법은 공개토론·정책설명·중재·공모 등의 공론화(公論化) 방식이었다. 법적 대응이나 찬반투표로 가기 전에 충분히 공적 여론을 형성하는 심의민주주의적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공론화 방식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시간·비용이 많이 들고 인내도 필요하다. 하지만 공권력이나 포퓰리즘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때 공론화는 제3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공론화 방식으로 풀자는 원칙이 제시됐다. 이명박 정부 때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었다. 출범 초기에 환경단체가 불참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최근 추진 일정을 확정, 공론화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제3의 해법마저 무산되면 우리는 미래 세대에 극히 위험한 폭탄을 넘기는 비겁한 행위를 해야 한다. 이번만은 파랑새가 공론의 날개로 날아가는 모습을 봐야 한다.
이규연 논설위원



![[오늘의 운세] 5월 3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