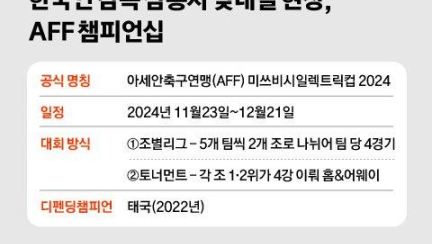소설 월평에 대해 회의를 느껴온 것은, 그것이 문학 인구나 일반인을 상대로 쓰여지고 있다기보다도 흔히 일부 작가·평론가를 겨냥하여 쓰여지고 있는 듯한 인상 때문이었다. 일반인은 소설을 애당초 읽지도 않는 터에, 이런 월평이 또 게다가 전문적·문학 이론적, 또는 문단 파벌적 논설만 일삼는다면 그것은 우스운 노릇이다. 나로서는 하나의 평범한 독자의 입장에서 말을 펴보려고 한다.
그러면 소설 독자의 입장에서 소설을 보겠다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몇 가지로 나누어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작가의 문학 행위, 평론가의 문학 행위도 중요하지만 독자의 문학 행위야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독자의 문학 행위란 소설을 읽는 것을 말한다.
분업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작가의 문학 행위가 소설을 쓰는 것을 말함이요, 평론가의 문학 행위가 소설을 올바로 이해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네 문학의 경우, 작가·평론가의 문학 행위는 있으나 독자의 문학 행위가 거의 배제되어 있는 문학이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체계적으로 따질 여유가 없거니와, 이것이 마냥 이렇게 된 상태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독자의 문학 행위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문학에 작가나 평론가가 도리어 창의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문학 풍토를 열망하게 된다. 그것이 그렇지 아니한 까닭에 우리네 소설은 평론가가 대종을 이루고 있고, 소설가가 의기소침이며, 독자가 도외시되고 있지나 않은가 저어한다.
따라서 이런 월평만큼은 무슨 원리적 가치를 논하는 것도 아닐 터이니 독자의 입장에서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독자들은 한편의 소실도 읽지 않는 경우가 태반인 판에, 일부 작가나 평론가들만 볼 것으로 전제하여 월평을 쓴다는 것은 간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모든 가치관의 무척이나 커다란 수정을 요구 내지는 강요받고 있는 이러한 시대 분위기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 삶이며, 우리의 삶이 역사 발전의 안목으로 볼 때에, 또는 현실의 계곡의 미묘한 웅덩이 속에서 어떻게나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소설들이 과연 어떻게 이를 형상화하고 있는지가 독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정말이지 우리의 모든 문화 현상이 사회의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하달되기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고 보면, 소설만은 그래도 하층에서 중층으로, 또는 중층에서 상층으로 올라오는 <목소리>와 <가락>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문이나 잡지를 봐도 그렇고 「라디오」나 「텔리비젼」을 틀어봐도 모두 상층부에 관한 이야기들뿐인 듯한데, 소설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독자들은 기대한다.
독자들뿐만 아니라 소설가 자신들도 평론가들도 근자에 이런 문제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소설에 관한 우리의 70년대식 질문 제기는 이처럼 까다롭고 어려운 조건 위에서 보다 근본적인 영토를 만들려는 몸부림임을 알게 한다.
자기 시대에 애정을 갖는다는 것은 이를 긍정하려 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자기 시대에 대한 혐오만으로써 진실을 광범위하게 포착한들 안타까운 노릇이니, 근자 소설가들이 어떻게 외적·내적으로 달달 들볶여지고 있을 것인지 그 현황을 도저하게 짐작한다. 그럼에도 어쨌든 소설들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문학지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쉬지 않고 이를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요새 소설들이 신통치 않다>라거나, <작가들은 어째서 걸작소실을 못쓰느냐>라는 식의 모두 거리로 후려치려는 듯한 고자세 일랑 제발 취하지 말고, 우선 당장 한권의 문학지라도 사 가지고 읽어볼 일이다.
나로서는 이 월평을 쓰기 위해 여러 발표 작품들을 읽으면서 어느 쪽이냐 하면 작가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막말로 해서 어디 지금 세상이 걸작 소설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인가. 게다가 <걸작>이라는 기준이 그렇게 함부로 형성되어질 수 있는 바도 아닌 것이다. <문사는 나약하다>식의 선입관으로 인하여, 또는 폐쇄적인 문학관을 빌미 삼아 소설가들을 이중적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투사들도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설가는 쓸 수 있는 것만을 쓸 것이며 나로서는 여러 소설들을 고마운 마음으로 읽었다.
물론 그 마음을 느꼈다해서 아무런 안목이나 기준도 없이 그냥 여러 소설들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님은 두말할 것도 없다.
「월간 중앙」의 2편, 「신동아」의 1편, 「세대」의 60년대 등단 작가 「6인선」, 「현대문학」의 9편, 「창작과 비평」의 2편의 단편 소설과 몇 개의 신문과 잡지의 연재 소설이 내가 읽은 것들이다. 욕심 같아서는 주간지나 기타 지·지의 소설들도 언급해볼 기회를 마련코자 한다.
가령 「문학 사상」은 외국 단편 소설들을 특집으로 꾸몄는데, 이 외국 단편들과 「세대」「현대 문학」 등에 실린 우리 작가들의 단편을 따져보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사실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외국 단편들은 읽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읽고 나서의 느낌도 남는게 없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보면 시골 대장장이의 상경한 아들을 통하여 보다 폭넓은 고민을 담고 있는 이문구씨의 『우산도 없이』 (세대)나, 신상웅씨의 일본 교포 사회를 말한 『끝없는 곡예』 (월간 중앙), 그리고 청소부를 화자로 한 『당신은 속고 있습니다』 (세대), 일종의 공상 과학 소설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는 분명한 조해일씨의 『1998년』 (세대), 그리고 범상한 일상에서 소재를 취택했으되 하나의 상징적 설득을 유도하는 이호철써의 『이단자』 (창작과 비평), 또는 조선작씨의 『영자의 전성 시대』 (세대)의 밑바닥 애정은 「문학의 <알리바이>를 소설로 답변한」 작품들인 것이다. 다른 작품들도 충분히 논급되어야할 것들이었다.
작가들을 후려친다고 해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닐 터이므로, 나로서는 평범한 독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학적 능력의 좋은 쪽을 좋은 쪽으로서 말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로되, 다만 문학하는 자의 염치라고나 할까 문학에 대한 기본적 태세에 관한 문제로서 가령 조선일보에 연재중인 『세종대왕』과 같은 소설의 경우 우리의 민주 지향 사회에 있어서 봉건 군주제의 지도자 상을 정립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띠는가 곰곰 생각해보면서 읽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오늘의 우리네 삶의 표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정신계의 맥을 짚어보는 그것은 무슨 특권적 일이 될 것도 없느니 만큼 「무덥고 긴 여름」을.끈질기고 지루하게 버티어볼 만이다.
ADVERTISEMENT



![[오늘의 운세] 5월 1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