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의 섬유 염색업체인 A사는 페놀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 지난 2월 환경부에 적발돼 고발을 당했다. 몇 해 전 새로 추가한 생산공정 탓에 유해물질인 페놀이 배출됐지만 A사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 1995년 처음 오염배출 허가를 받은 뒤 A사나 안산시 모두 어떤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지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유리제품을 생산하는 전북의 B사는 먼지 배출허용기준이 50ppm인데도 평상시에는 그 10분의 1인 5ppm에 맞춰 배출하고 있다. 공장 가동 중 갑작스럽게 기준치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년 내내 기준치를 밑돌다가도 단속 때 한 번 적발되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미리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5일 이 같은 오염배출 허가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까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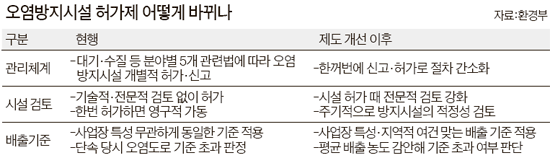
통합관리제도는 기업·전문가·정부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자는 게 목표다.
제도가 도입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가 업종별로 가장 적합한 오염방지기술(BAT·Best Available Technique) 목록을 제시하게 된다. 기업은 정부·지자체와 협의해 BAT 목록 중에서 지역·업종·사업장 특성에 맞는 기술을 채택하게 된다. 정부는 오염배출시설의 허가·설치·운영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활동을 뒷받침한다.
환경부 김효정 허가제도선진화 태스크포스팀장은 “지금은 공장설립 때 대기·수질·토양 등 분야별 5개 법에 따라 8가지 오염방지시설을 따로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되면서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며 “BAT를 채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순간 오염도가 아니라 평균적인 오염도를 바탕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BAT는 오염방지시설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에까지도 적용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제고와 원료 절감을 통해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BAT는 한번 허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5년)마다 오염방지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최광림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국내 기업 수준에 맞는 BAT를 정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 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