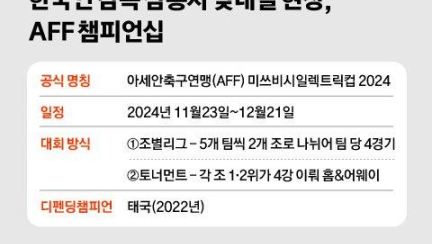술은 잔 (잔) 마다 새 맛이다. 첫잔은 기름처럼 혀에서 구른다. 감칠맛이다. 두 잔은 제 맛을 알아보게 한다. 석 잔째는 홍조가 뉘엿뉘엿 찾아든다. 다 섯잔은 거나해서 받는다. 열 잔을 들면 세상은 황홀하다. 「이백일두 시백편」의 기분은 가히 짐작이 간다.
술이 건강에 좋으냐 나쁘냐는 문제는 술맛 쫓는 얘기다. 술은 오늘의 발명품이 아니다. 인류의 선조는 유사이전에 이미 바위틈에 괸 술을 마셨다. 오늘의 술은 수십만년을 계속해온 그 예술품의 걸작들이다. 굳이 따지면 술은 소화기안에서 기름기를 분산시켜 소화흡수를 돕는다. 반주는 괜한 멋이 아니다.
1954년 5월10일 AP통신에 의하면 미국「로스앤젤레스」에 사는「삼·레믈러」옹은 114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평생은 숙취속에 흘러갔다. 하루에 적어도 10잔의 「위스키」를 마시고 담배는 줄담배를 피웠다. 주호들은 지금이라도 그 핑계를 대면 술맛이 한결 새로울 것이다.
주호라고 춘추가 지긋하지만은 않다. 「캐나다」엔 조산아가 「알콜」중독에 걸렸던 일도 있다. 61년「캐나다」「유콘」주에 사는 28세의 어머니는 주독이 오른 코주부부인이었다. 아기를 낳고보니 술냄새가 진동하기 않는가. 「인큐베이터」속에서 이아기는 노상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생후24시간 만에야 아기는 취기에서 깨어났다. 지금쯤 그 아기 주호는 학교에 다닐 것이다.
고사에 나오는 명주로는 천일주가 있다. 태평광기에 보면 협희라는 양주의 명인은 한 잔에 천일을 취하게 하는 술을 빚어냈다. 유현석이란 주호는 이 술을 마시고는, 정말 죽었다 살아났다. 현석은 의식을 잃고 잠이 들어 깨질 않았다. 가족들은 울며불며 장례를 치렀다. 3년이 지난 뒤에 협희가 그 소식을 듣고 무덤을 파게 했더니, 현석은 눈을 뜨더라는 것이었다.
공연히 술맛을 돋우어놓았다. 그것은 명주얘기 들이다. 우리 주변엔 「실명주」는 있어도 명주는 없다. 술을 마시면 취하기야 물론 취한다. 눈도 가물가물 한다. 그러나 세상은 암흑이 되고, 의식은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술은 조용히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앞으로 양주업은 성직자에게 맡긴다는 특례법이라도 있어야지, 이러다간 『늙어지면 못 노는 세상』이 멀지않아 찾아올 것 같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