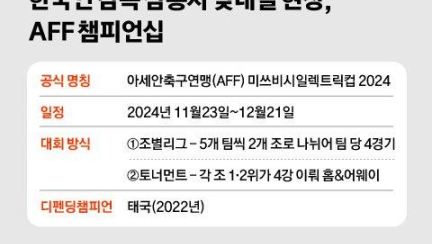미국 프로야구 류현진(26·LA 다저스)은 지난 1일(한국시간) 콜로라도와의 홈경기에서 6이닝 동안 삼진 12개를 빼앗으며 2점만 내주고 승리투수가 됐다. 류현진의 다음 등판은 6일 샌프란시스코와의 원정경기다. 등판 사이의 휴일이 4일에 불과하다.
올해 초 다저스는 선발요원이 9명이나 된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부상으로 하나 둘 빠져나갔다. 시즌 개막 후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지키는 선발은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와 류현진, 조시 베킷 등 3명뿐이다. 류현진의 등판 간격이 상당히 빡빡한 이유다.
다저스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공백은 잭 그레인키의 부상이었다. 그레인키는 지난달 12일 샌디에이고전에서 카를로스 퀜틴에게 몸맞은공을 던졌다. 화가 난 퀜틴이 달려들어 그레인키를 어깨로 들이받았다. 미식축구에서 볼 수 있는 태클이었다. 그레인키는 쇄골이 골절돼 수술을 받았다. 그가 두 달 동안 던지지 못하는 바람에 류현진이 커쇼에 이어 제2선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들이 4월 12일 경기 중 몰려나와 거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다저스 류현진도 무리에 섞여 있다. 거친 몸싸움 끝에 다저스 투수 잭 그레인키는 쇄골이 골절돼 수술까지 받았다. [샌디에이고 AP=뉴시스]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들이 4월 12일 경기 중 몰려나와 거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다저스 류현진도 무리에 섞여 있다. 거친 몸싸움 끝에 다저스 투수 잭 그레인키는 쇄골이 골절돼 수술까지 받았다. [샌디에이고 AP=뉴시스]
72세 된 ML 수석코치도 내동댕이 쳐
그레인키와 퀜틴이 싸움을 벌일 때 양팀 선수들 모두 그라운드로 몰려들었다. 물론 류현진도 뛰어나갔다. 싸움에 가담하지 않고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는 팀에 벌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몸싸움을 벤치클리어링(Bench-clearing)이라 부른다. 여기까지는 한국과 미국의 방식이 같다. 싸움이 시작되면 미국 선수들이 훨씬 ‘세게’ 붙는다.
당시 류현진은 깜짝 놀라 멍하니 상황을 지켜봤다. 그는 “한국에서 그런(골절이 되는) 몸싸움이 일어났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라며 웃었다. 한국에서의 벤치클리어링은 우르르 몰려들어 밀고 당기다 말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은 격투기처럼 싸운다.
야구는 신체 접촉이 거의 없는 종목이다. 그러나 투수가 던진 시속 150㎞의 빠른 공에 맞는다면 타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투수는 방망이를 들고 있는 타자가 덤비면 죽을힘을 다해 맞서야 한다. 한 번 싸움이 붙으면 실전에 가까운 격투가 벌어지는 이유다.
 박찬호(왼쪽)가 다저스에서 뛰었던 1999년 LA 에인절스 투수 팀 벨처와 몸싸움을 하다 발차기를 하고 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발차기를 금기시한다. [사진=중앙포토]
박찬호(왼쪽)가 다저스에서 뛰었던 1999년 LA 에인절스 투수 팀 벨처와 몸싸움을 하다 발차기를 하고 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발차기를 금기시한다. [사진=중앙포토] 미국 4대 스포츠 가운데 몸싸움이 가장 많은 아이스하키는 개인과 개인의 대결이다. 야구는 패싸움이 기본이다. 야구에서 동료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자신도 언제 빈볼(머리를 향해 날아드는 공)의 희생양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벤치클리어링에는 불문율이 있다. 레슬링이 허용되고 때로 주먹이 오가기도 하지만 발을 쓰는 건 용서받기 힘들다. 야구 스파이크에는 날카로운 징이 박혀 있다. 2011년 미국의 스포츠전문 웹진 블리처리포트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행동 50가지’를 선정했는데 박찬호가 다저스에서 뛰었던 1999년 LA 에인절스 투수인 팀 벨처에게 ‘두발당성’을 한 사건을 44위로 꼽았다. 당시에도 미국 언론은 “박찬호가 ‘태권도 발차기’를 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야구 방망이 등 도구를 쓰는 것도 불문율을 깨는 것이다. 거칠게 싸우는 미국에서도 배트가 동원된 벤치클리어링을 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의 불문율엔 ‘나이’는 없다. 2003년 보스턴 투수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난투극 도중 당시 72세 노인이었던 뉴욕 양키스 수석코치 돈 짐머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한국은 한 다리 건너면 모두 학연·지연
한국에서도 과격한 몸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다. 1990년 6월 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OB-삼성전이 대표적이다. OB 김진규의 공에 맞은 삼성 강기웅은 방망이를 들고 마운드로 뛰어나갔다. 오랜 라이벌 관계였던 두 팀 선수들이 모두 몰려나와 주먹과 발길질이 오갔다. 몇몇 선수는 형사 입건까지 된 큰 사건이었다.
프로야구가 성숙해지면서 국내에서 거친 몸싸움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승부의 치열함은 메이저리그 못지않지만 한 다리 건너면 모두 선후배로 얽히는 한국 고유의 문화가 크게 작용하는 탓이다.
지난해 한화 4번 타자 김태균은 공에 맞고도 오히려 사과하는 해프닝을 일으켰다. 6월 6일 롯데 투수 김성배의 공에 허리를 얻어맞은 그는 1루로 걸어가며 “사과해”라고 말했다. 김성배는 “내가 왜 사과하느냐”고 맞서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양팀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몰려나왔다.
김태균은 김성배가 후배인 줄 알았다고 한다. 공을 얻어맞았으니 사과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반응이 없자 소리를 쳤다. 사실 김태균이 1년 후배였다. 김성배가 1군 등판 경험이 별로 없어 당연히 후배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튿날 김태균은 김성배를 찾아가 “반말을 해 죄송하다”고 되레 사과했다. 잘잘못보다 선후배 관계가 우선이 된 것이다. 한국에서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는 50여 개에 불과하다. 학연과 지연을 따지면 예외 없이 선후배로 얽힌다. 한국 야구에서 벤치클리어링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 선수와 외국인 선수의 싸움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지난달 16일 광주경기에서 KIA 타자 나지완과 LG 투수 리즈는 몸맞은공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리즈의 강속구에 허리를 맞은 나지완은 싸우겠다는 듯 마운드로 걸어갔다. 리즈가 두 살 많지만 외국인 선수는 ‘선배’가 아니기 때문에 망설임이 없었다. 두 팀 선수들이 몰려나와 대치상황이 벌어졌고 곧 정리됐다. 상황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도 선후배 관계가 작용했다. 나지완의 신일고 선배인 LG 포수 현재윤이 나서 후배를 저지했다. 그러자 현재윤과 과거 삼성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김평호 KIA 코치가 현재윤을 밀쳤다.
나지완은 지난해 7월 3일 광주에서 두산 프록터와 시비가 붙었다. 양팀 선수들이 몰려오는 과정에서 두산 좌익수 김현수도 소리를 치며 달려왔다. 신일고 후배 김현수가 언성을 높이자 나지완은 분을 참지 못했다. 나지완은 위협구를 던진 프록터를 용서했지만 김현수에 대한 서운함은 쉽게 해소하지 못했다.
외국인 타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미국식 싸움이 벌어진다. 대표적 악동이 롯데 간판타자 호세였다. 그는 2001년 9월 18일 마산경기에서 삼성 배영수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2006년 8월 5일 인천경기에서는 SK 신승현과 거칠게 부딪혔다. 이때 신승현은 야구 배트를 들고 호세와 대치했다. 호세가 ‘선배’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드물긴 하지만 외국인 선수끼리 충돌하면 싸움이 더 커진다. 2004년 8월 5일 삼성 호지스와 SK 브리또, 카브레라의 감정이 복잡하게 엉켜 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카브레라는 당시 만 63세였던 김응용 삼성 감독과 드잡이를 했다. 거친 싸움은 김응용 감독이 끝냈다. 감독 또는 대선배의 권위가 아닌 완력으로 카브레라를 제압해 버렸다.
김식 기자



![[오늘의 운세] 5월 1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