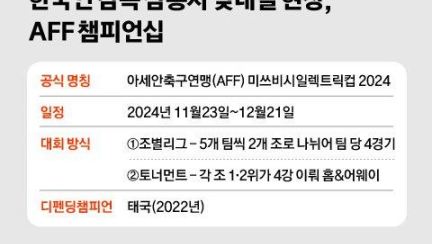"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강덕(52·사진) 해양경찰청장의 인천 송도 집무실엔 남북이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다. 제주도가 맨 위에 있고, 중국과의 국경은 제일 밑이다. 그는 “보통 지도는 한반도를 대륙의 일부로 보지만, 이 지도는 해양으로 진출하는 한반도가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인 ‘원양 해경론자’다. “해경이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배와 선원을 지켜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경찰대를 나와 서울지방경찰청장까지 지낸 ‘육경’(‘육지경찰’의 준말, 경찰을 일컫는 해경 용어) 출신이다. 그렇지만 해경으로 몸을 옮겨 실으며 “해기사 자격증, 요트 면허, 모터보트 면허를 땄다. 진정한 해경으로 거듭났다”고 말한다. “앞으로는 해경 출신 해경청장이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그로부터 창설 60주년을 맞은 해경의 비전을 들어봤다.
-해경이 올해 창설 60주년을 맞았다.
“보람 있다. 국민의 지지와 해경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 우리 영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찮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대치 중인 중국과 일본은 각각 우리의 이어도와 독도도 노리고 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한·일(1999년), 한·중(2001년) 어업협정을 통해 어업문제는 잠정적으로 해결된 상태다. 그러나 중국·일본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는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해경은 독도·이어도·EEZ에 1000t급 이상 대형 함정을 매일 10척 이상 배치하고 있다. 항공기 순찰도 주기적으로 한다.”
-지난달은 중국어선 나포 도중 숨진 고(故) 이청호 경사 1주기였다. 이 경사의 사망 이후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달 인천 월미공원에 그의 흉상이 세워졌다. 나도 제막식에 참석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없도록 불법조업 단속 장비와 전술을 계속 개발했다. 중국어선들이 나포를 막기 위해 배를 서로 엮는 ‘연환계’를 깨는 비법도 마련했다. 법무부·농림수산식품부와 협조해 불법 조업에 대한 벌금을 2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국 선원들의 무차별 불법 조업에 대해 일부에선 우리가 중국에 저자세를 취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절대 저자세는 아니다. 늘 직원들에게 단속을 엄정하면서도 냉정하게 하라고 강조한다. 중국 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조업 채증작업도 철저히 한다. 이 때문인지 최근 중국어선의 저항 강도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어선들의 자발적인 준법조업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믈라카 해협이나 소말리아 근해에서 해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적은 일부 국가에서 전도유망한 사업으로 대접받고 있다. 한국은 현재 해군 청해부대를 소말리아에 파견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적 퇴치는 해경이 맡아야 한다. 해적은 군사작전 목표가 아니라 법집행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아프리카 공관에 정보수집과 국제협력 목적으로 해경 주재관을 보내려고 한다. 또 믈라카 해협과 남태평양에 대형 경비함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왜 원양을 강조하는가.
“한국은 세계 8위의 무역대국이다. 우리 국민이 나가 있지 않은 바다는 없다. 이들이 도움을 필요할 땐 해경이 달려가야 한다. 인명구조는 군보다 해경이 더 잘한다(웃음). 해경은 중국의 해감총대와 일본의 해상보안청과 경쟁하지만 해적 퇴치와 인명구조에선 그들이 파트너이기도 하다.”
-해경이 국토해양부 소속에서 다시 부활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변경된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여러 부처로 나눠진 해양정책 기능들이 다시 해수부로 모여지기 때문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일본 해상보안청 등 해양 선진국에서도 해상 치안기관을 해양 관련 부처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도 해감총대가 속한 국가해양국을 해양부로 승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