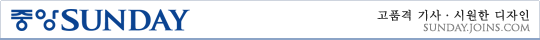구하기김경문 감독은 그를 2001년에 처음 봤다고 한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정기전 때였다. 고려대 동문으로서 운동장을 찾은 김 감독(당시 두산 코치)은 그날 모교 후배들보다 연세대 주전포수로 마스크를 쓴 채상병이 눈에 쏙 들어왔다고 한다.
“제가 포수 출신이라 그랬던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또 그날 (채)상병이는 4번타자였습니다. 체격도 당당하고 공 받는 자세도 좋아서 잘 크면 좋은 선수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김 감독에게 점찍힌 채상병은 사실 고교(휘문고) 시절부터 촉망받는 블루칩이었다. 그는 1년 선배 손지환(KIA), 동기 박용택(LG), 유재웅(두산) 등과 1996년 휘문고를 전국 최강으로 이끈 멤버였다. 그러나 그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대학에서 크게 빛을 내지는 못했다. 그는 동기포수 강귀태(현대), 현재윤(삼성)과 비슷한 평가를 받아 한화 이글스에 2차 5번으로 지명됐고 2002년 프로 유니폼을 입었다.
갓 입단한 신인포수에게 주전포수 자리를 선뜻 내주는 팀은 없다. 더구나 채상병은 ‘수퍼루키’도, ‘대형포수’도 아니었다. 간간이 백업포수로 마스크를 썼지만 인상적인 활약과는 거리가 멀었다. 채상병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건 2003년. 베테랑 투수 문동환과 트레이드돼 두산으로 팀을 옮기면서였다. 두산 입장에서는 자유계약선수 정수근(롯데)의 보상선수로 지명한 문동환이었다. 그때 언론은 ‘문동환의 트레이드 대상’으로서 채상병을 잠깐 주목했다. 그러나 “왜?”라는 데는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다. 두산에는 홍성흔이라는 프랜차이즈 스타가 있고, 베테랑 강인권이 그 뒤를 든든히 받치고 있었다. 채상병의 자리는 없었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 이 트레이드는 2004년 15경기만(그것도 백업으로) 뛴 채상병이 군에 입대하면서 머리에서조차 잊혀졌다. 그러나 김경문 감독의 마음속에서는 아니었다. 그는 김태형 작전코치에게 ‘채상병 특별관리’를 당부했고 포수 출신 김태형 코치는 주말이면 외출 나온 채상병과 땀을 흘렸다.
올해 군에서 제대한 채상병은 곧바로 5월 19일 KIA전부터 백업으로 홍성흔의 뒤를 받쳤고 5월 23일 LG전부터는 선발포수로 출전했다. 그가 마스크를 쓰면서 두산의 상승세는 더 가파르게 치솟았다. 시즌 초반 최하위였던 성적은 2위가 됐고 채상병은 아예 주전포수가 됐다. 그리고 이종욱, 고영민, 김현수, 민병헌 등과 함께 김경문의 아들
‘문 차일드’의 당당한 일원이 됐다.
김경문 감독에게 채상병을 어떻게 키웠느냐고 물었다.
“능력이 있는 선수다. 과거의 경력이 말해준다. 그에게 필요했던 건 프로선수로서의 창의력이다. 포수는 누구나 자신이 낸 사인 때문에 안타를 맞고, 홈런을 맞는다. 그래서 한순간의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난 그저 그 시간을 기다려주려고 애썼다. 실수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기다려주지 못했다면 성장이란 열매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김 감독의 설명에서 ‘실수의 미학’을 발견할 수 있다. 그가 ‘채상병 일병 구하기’를 통해 주전포수를 만들어 내는 과정, 그리고 채상병이 ‘흔들리는 두산 구하기’로 팀에 기여하는 과정. 이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 달콤한 열매로 승화된 탁월한 예가 아닌가.
이태일 네이버 스포츠팀장

![[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