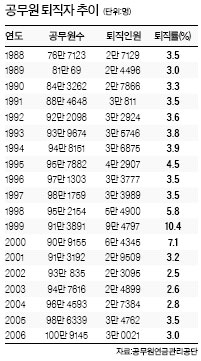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A부장은 부서원들과 회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자기 일은 열심히 했으나 부하직원들은 불만이 쌓였다. 자연히 “통솔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주변에서 나왔다. 2005년 12월, 그는 하루아침에 부장에서 ‘기동사업반 A씨’로 강등됐다. 공단은 A씨 같은 ‘문제 간부’ 34명을 기동사업반에 밀어넣었다. 3개월마다 이들의 실적을 평가해 하위 10%를 면직하겠다고 했다. 이들에겐 고액ㆍ장기 체납금 징수 임무가 주어졌다.
충격요법식 ‘퇴출 실험’ 실패…DJ정부 땐 ‘무능력자’보다 ‘고령자’ 위주 면직
서울시의 퇴출 제도가 공직사회를 발칵 뒤집어놓고 있으나 건보공단은 2001년부터 두 차례 이런 퇴출실험을 했다. 그러나 해직은 거의 없었다. A씨의 경우 2006년 10월 평가에서 1등을 차지, 1년 만에 다시 부장 직책을 맡았다. 공단 측은 “A씨가 하루 종일 고객에게 전화하고 동료들에게 살갑게 대하는 등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기동사업반 34명 중 A부장처럼 원래 자리로 복귀한 사람은 10명. 21명은 한 단계 낮은 직책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다. 퇴직한 사람은 3명이었다. 그나마 이들은 대기발령 도중 정년을 맞아 퇴직했다. 2001년 퇴출실험 때는 지사장ㆍ부장 등 간부 300여 명이 지역본부로 내려갔다. 이들도 역시 건강보험 체납금 징수 업무를 맡다 1년 뒤 대부분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공공기관으로서 의미 있는 실험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온정주의와 정년보장이 일반화된 조직에서 퇴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줬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강제 퇴출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오세훈 시장은 “문제 공무원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 자극을 주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끝나고 건보공단 사례처럼 실제 퇴출되는 공무원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행정학자들은 “공직 사회에서 퇴출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3%니 5%니 퇴출 규모를 정하기에 앞서 엄격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퇴출 후보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박사는 “과거에도 퇴출을 시도했다가 부작용이 많았던 만큼 이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앙인사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정부 구조조정 작업과 관련, 서울대 김병섭(행정대학원)ㆍ연세대 양재진 교수에게 ‘공무원 퇴직제도 연구’를 맡겼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기능직ㆍ고용직의 감축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 고위직보다는 하위직, 경제부처보다는 비경제부처에서 감축의 강도가 컸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힘없는 공무원들이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다.
연구팀이 퇴출당한 공무원 46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중요한 퇴직자 선정기준’으로 86%가 ‘연령’을 꼽았다. 이어 ‘학연ㆍ지연 등 연줄’(6.9%)을 든 사람이 많았고 ‘업무능력’(6%)이 세 번째였다. 보고서는 “퇴직기준이 업무능력 등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여야 하는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물론 서울시는 퇴출후보자 102명을 발표하면서 해당자들의 구체적인 근무태만 실태 등을 공개했다. 한국방송통신대 이선우(행정학) 교수는 “마음만 먹으면 현재의 제도로도 10%까지 퇴출할 수 있는데 굳이 ‘3% 퇴출제’를 공론화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학자는 “퇴출 리스트에 올려 망신을 주고 나중에 온정적으로 구제해 주는 일이 반복되면 인사혁신은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점 만점에 11점"…英 독설 심사위원 놀래킨 '3분 태권 무대' [영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6/2b284bb2-8e01-43b7-8a9e-8da5c241b0ea.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