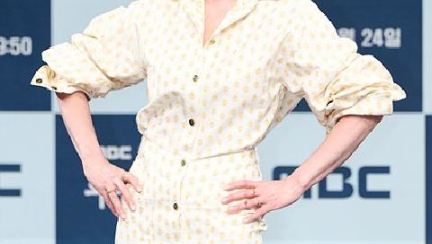◆ "신문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중앙대 성동규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의 원래 목적은 정부에 대한 비판.감시.견제이며, 특히 신문이 심층보도를 통해 이런 역할을 구현하는 것은 당연하고 근본적인 일"이라며 "이런 신문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가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임상원 언론학부 교수는 "팩트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 언론의 보도를 '위조지폐'니 국가 기본질서를 흔드느니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연세대 윤영철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나온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재정 문제로 언론과 싸우다니"=구정모 강원대 교수(전 재정.공공경제학회장)는 "중앙일보 기사는 학계.정부 모두 곱씹어 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며 "성급하게 논쟁을 가열시키지 말고 냉정한 토론을 통해 현명한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안종범 경제학부 교수는 "중앙일보 보도의 취지는 다른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공공부문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가 흥분하며 나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외국의 경우는 공기업이 거의 민영화됐으니 그런 논란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이 일종의 재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국가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김준영 경제학 교수는 "재정의 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며 "국가 부채 등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언론의 견해를 진솔하게 바라본 뒤 혹시 오해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재정 규모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활발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재정학 전공)는 "정부 재정을 얼마로 볼 것인가는 굉장히 자의적인 문제이며 기준을 세우기 나름"이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왜 재정문제를 가지고 언론과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며 "문제는 기준보다 재정의 투명성인 만큼 정부가 이를 증명하면 될 텐데 기준 문제를 놓고 언론을 공격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산하 조세연구원의 김정훈 박사는 "(중앙일보 보도가) 공기업을 재정에 넣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단순히 큰 정부를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큰 정부여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핵심"이라며 "공기업을 넣어 재정을 부풀리면 이런 메시지 전달에 실패한다"고 말했다.
◆ "언론과 학문에 대한 무지를 보여준 처사"=이석연 헌법포럼 상임대표(변호사)는 "언론의 지적을 극단적인 표현으로 매도한 변양균 장관의 발언은 오히려 국가 기본질서인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언론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무지를 보여준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일보가 보도 내용에서 재정 규모를 추산한 자세한 기준과 근거를 설명했고 이에 대해 이론을 펴는 측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국기 교란' 등의 용어로 공격하는 행태는 현 정부의 포퓰리즘적 성격을 극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선 변호사도 "정부 정책이나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진단하는 전형적인 언론의 역할을 한 보도를 두고 정부가 언어적인 폭력과 감정적인 편 가르기를 통해 잠재우려 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탐사기획 특별취재팀

![[오늘의 운세] 6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