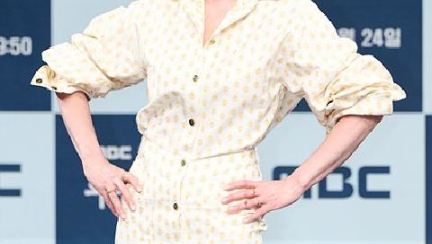『실례지만 누구시죠?』 <전화에서>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여성에게>
『실례지만 그 옷 얼마에 사셨죠?』<여성끼리>
우리주변에서는 이같은 언어가 일상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실례지만』만 얹으면 다음에는 무슨실례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모양이다. 『실례지만』이무슨 만병통치 약인가.
대체로 문명한 사회일수록 교양 있는 말은 직접법보다 간접적표현을 쓰고 있는것 같다.
자기의사에 의한 행동이건만 상대방의 허락아래 행해지는것으로 아는 사고방식이다. 예컨대 『저로 하여금 ∼하게 해주실수 있습니까? (혹은 해주시니-)』식이다. 우리의 경우 이같은 동사의 수동형은 발달이 못됐지만, 그대신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은 예로부터 미덕으로 삼아 왔던 것이다.
그러면 앞서 전화를 중계하는 언어는 어떻게 표현하는것이 상대방에게도 불쾌감을 안 주고 품위 있어 보일까. 간접적표현이 적당하다.
『어디시라고 전할까요?』<보통>
『어디시라고 여쭐까요(말씀드릴까요?)』 <좀더 정중한 경우>
앞의것은 부인이 남편한테 온 전화를 받는경우,
후자는 자녀들이나 아랫사람이 그 집 어른을 대드리는 경우에 적당하다. 전화가 현대생활에서 중요하다는것 I친소와 이해에 직결되는수가 있음은 여기서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데,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고, 더불어 가풍이니 가정교육까지 들먹여지는것은 여러모로 이로울것이 못된다.
다음으로 여성에게 나이를 묻는 실례다. 문화국민으로서 이 매너가 몸에 배지 못한것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한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난 이때, 50세만 넘어도 사회의 공기인 신문이 노파·할머니로 지칭하고 관정의 창로, 공항에서까지 아줌마·할머니등의 호칭이등장하는 사회, 아직도 우리는 예의에서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또 면전에서 남의 옷값을 묻는것, 이것도 본인이 자진해서 말하기 전에는 친한사이라도 예절은 아니라 생각한다.

![[오늘의 운세] 6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