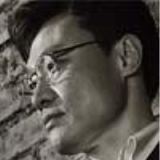이규연
이규연논설위원
“한국, 코스트 가드(coast guard) 해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해경 해체”를 언급하자 외신은 이렇게 표현했다. 영어로 표현해놓고 보니 해안경비 업무를 포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외신뿐 아니라 국내의 일부 언론이나 야권도 그렇게 받아들인다. 대통령이 강하고 비장하게 표현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담화의 문맥과 청와대의 후속 설명으로 판단하면 코스트 가드의 해체가 아니라 ‘해양경찰청의 해체’로 봐야 한다. 일반 사법권을 육지경찰에 넘기고 나머지 업무와 조직을 국가안전처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해양경찰청이 국가안전처에 흡수되는 것을 제외하고 하부 조직은 크게 바뀔 게 없다. 따라서 해경 해체보다 해양경찰청의 해체가 합당한지 따져보는 게 휠씬 적확한 접근 방식이다.
해양경찰청의 가장 큰 문제는 ‘코스트 가드 DNA’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해안경비대(코스트 가드)와 일본의 해상보안국은 교통부나 국토부에서 출발했다. 우리로 보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구조구난, 해안수색, 영해경비, 오염방지가 주 업무다. 수사는 밀수·밀항·조업단속같이 바다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안에 집중된다.
반면 우리 해양경찰청의 뿌리는 치안경찰이다.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의 해양경비대가 그 시초다. 91년에는 경찰청 산하 해양경찰청이 됐다. 96년 해양수산부 산하로 옮겨갈 때까지 육지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사정보 보직을 차지하려 하고 오염방지·구조구난 업무는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했다. 임용 과정 역시 육지경찰과 코스트 가드 사이에서 어정쩡한 방식을 취했다.
세월호 참사 초기 때 현장지휘자는 이용욱 당시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이었다. “구원파 신도였다”는 구설에 오르면서 지휘업무를 내놓았던 그는 조선공학 박사 자격으로 특채된 사람이다. 그런 그가 정보수사국을 맡고 있었다. 전문 분야에 관계 없이 해양경찰청에서 잘나가려면 육지경찰처럼 정보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경의 상당수가 해양 근무 경력이 없다는 사실 역시 기형적인 해경 문화의 단면이다. 해양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해경이 발에 물을 묻히지 않으려 한다”는 비아냥이 나돌았다. 침몰하는 세월호 앞에서 머뭇거렸던 해경의 모습은 이런 ‘육경 문화’의 산물이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는 “육지경찰처럼 운영해오던 해경을 선진국형 코스트 가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수사권에 몰두하는 육경DNA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안경비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구조·운영 방식을 바꾸고 구조구난·경비·해안오염방지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해양에 적용되는 특별사법권을 주면 일반사법권 이양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지금까지 200~300명을 구조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몇 명인가요.”(교육생)
“22명.”(해양구조의 전설)
“예?” (교육생)
“구해내지 못한 게 22명, 나에겐 그 숫자가 중요해.”(전설)
8년 전 개봉한 케빈 코스트너(전설) 주연의 영화 ‘가디언’에서 나온 명대사다. 미국 해안경비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화에서 ‘전설’은 최정예 구조요원을 키워내기 위해 지옥훈련을 강행한다. 영화는 선망의 코스트 가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세밀하게 그려낸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여준 해경의 모습은 참담했지만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문책이 아닐 것이다. 육경 흉내나 내는 해경이 아닌, 영화 속 ‘가디언’으로 거듭날 미래를 희망한다. 대통령 구상대로라면 해양경찰청은 죽게 된다. 그러나 하기에 따라 해경이 제대로 살아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규연 논설위원
![[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