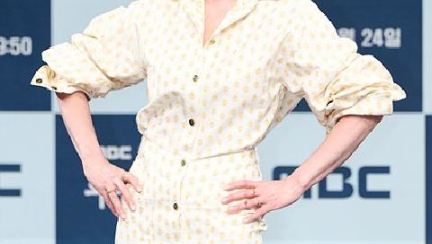박종수
박종수금융투자협회 회장
중산층이 점점 줄어든다고 한다. 최근 한 조사에서 자신이 중산층이라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17%에 불과할 정도로 양극화 체감도가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단연 높다. 급속히 고령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대비와 중산층 복원은 함께 맞물려 있는 전 사회적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17일 출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투자 기회가 주어지는 대표적인 중산층 만들기 상품이다. 소장펀드는 근로자가 매년 600만원까지 투자하면 연말정산 때 약 40만원을 환급해 준다. 펀드가 원금만 지켜도 연 6.6%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셈이다. 내년부터 교육비와 의료비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 가입이 가능한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이다.
소장펀드는 대표적 장기투자상품으로 노후 대비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 펀드는 최소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다. 단기투자에 익숙했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장기투자를 하는 경험이 될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83년부터 2012년까지 30년간 주식은 28배, 채권은 16배, 예금은 8배, 부동산은 4배 올랐다. 그런데 왜 주변에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은 걸까. 이에 대해 미국 증시의 권위자인 펜실베이니아대 제레미 시걸 교수는 주식 투자수익은 전체 투자기간 동안 균일하게 발생하지 않고 10% 기간 내에서 집중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투자자가 단기적인 시장 상황을 예측해 잦은 매매를 하면 손해 볼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투자 상품이자 중산층 만들기의 수단으로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은 2005년 국내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다. 당초 가입자들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장기투자로 수익률을 높여 노후 연금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약 94%의 자금이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돼 있다. 적어도 2~30년간 장기로 투자할 퇴직연금 자금을 인플레이션보다도 낮은 금리에 묻어 두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다. 성공적인 퇴직연금 사례로 꼽히는 호주의 수퍼애뉴에이션이나 미국의 401(k)의 경우 가입자 대부분이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 위주로 장기투자를 한다. 금융위기 등 일시적인 등락을 거치기는 해도 전체 평균 수익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위기 때마다 자국 자본시장을 뒷받침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 경제는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에 비례해 높아 가는 세금 부담을 감당하면서 노후 중산층을 양성할 수 있을까?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개인의 복지와 안정적 노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민이 스스로 자산을 늘려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것이다. 소장펀드와 퇴직연금이 바로 중산층 만들기 프로젝트의 답이 될 수 있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

![[오늘의 운세] 6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