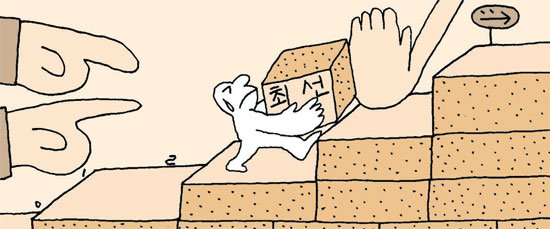 [일러스트=강일구]
[일러스트=강일구] 이훈범
이훈범국제부장
당연한 소리는 당연해서 주목받지 못한다. 자꾸 하면 물정 모르는 반편이 됐다가 또 하면 욕을 먹는다. 혜안(慧眼)과 범안(凡眼)의 갈림길이 이 대목이다.
예를 보자. 동일본 대지진 때 후다이(普代) 마을 얘기다. 인구 3000명 안팎의 이 작은 어촌은 이웃 도시들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쓰나미에도 단 한 명의 희생자가 없었다. 반세기 전 와무라 유키에 촌장의 ‘당연한 소리’ 덕분이었다.
1960년대 방조제 공사 때 와무라 촌장은 15.5m 높이의 방조제를 주장했다. 인근에서 가장 높은 방파제가 10m였다. “만리장성을 쌓느냐”는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았고, 끝내 관철시켰다. 방조제가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예산낭비라는 비판들이 터져나왔다.
당연한 소리가 늘 그런 것처럼 와무라 촌장의 논리는 간단했다. 메이지 시대 때 15m 높이의 파도가 온 적이 있다는 거였다. 한번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은가. 너무도 당연한 소리였다. 쇼펜하우어가 이를 한칼에 정리하는데 읽을 때마다 무릎이 절로 쳐진다. “모든 진리는 3단계를 거친다. 처음엔 조롱을 받고 다음엔 반대에 부닥치다가 결국은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연한 소리가 자명한 진리가 되는 데는 와무라 촌장 같은 사람의 혜안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없었기에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는 또 한번 소 잃고 고치는 외양간이 됐다. 강당 지붕에 쌓인 눈을 걱정스레 바라보는 눈이 있었을 테고, 폭설 속에서 행사를 강행해야 하느냐는 생각도 있었을 텐데 조롱과 비판을 겁내다 스스로 범안이 되고 말았을 터다.
사고 며칠 전 각 대학에 보낸 교육부 공문이 있었기에 안타까움을 더한다. 거기엔 강원·경북 대설특보도, 문제가 된 ‘샌드위치패널 지붕’도, 제설과 사용중지 당부도 모두 있었다. 반쯤 떴던 지혜의 눈을 부러 감아버린 것이다.
혜안이란 불가능한 걸 이루는 기적이 아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절로 떠지는 것이다. 생각 같아서야 30m 방조제를 쌓고 쓰나미는 잊고 살면 그만이다. 모든 건물에 핀란드식 열선 지붕을 덮고 풍경을 즐길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늘 돈이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얻어야 하는 게 현실 아닌가.
평소 눈이 많지 않은 경주에 열선 지붕은 분명 낭비다. 하지만 그 명제가 참인 건 평소 같지 않은 기상이변에 늘 눈뜨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렸을 때뿐이다. 경주나 눈의 문제만이 아니다. 매사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성프란체스코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할지 힌트를 준다. “주여,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제가 할 수 없는 건 체념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글=이훈범 국제부장
일러스트=강일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