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어서부터 생활비를 쪼개 나눔을 실천한 김길윤 할머니. 요즘도 매일 도시락을 만들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돌린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는 ‘나눔 DNA’는 아들·손자에게 대물림됐다. 왼쪽부터 장남 신규창씨와 그의 아들 택형군, 김 할머니, 차남 규영씨. [프리랜서 공정식]
젊어서부터 생활비를 쪼개 나눔을 실천한 김길윤 할머니. 요즘도 매일 도시락을 만들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돌린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는 ‘나눔 DNA’는 아들·손자에게 대물림됐다. 왼쪽부터 장남 신규창씨와 그의 아들 택형군, 김 할머니, 차남 규영씨. [프리랜서 공정식]어머니는 늘 죽을 쑤어 배고픈 이웃과 나눴다. 가족도 그 죽을 함께 먹었다. 그걸 보며 자란 딸은 아끼고 또 아껴 고아와 장애 학생을 도왔다. 그렇게 새겨진 나눔 DNA는 그 아들·손자에게로 대물림됐다. 4대째 나눔을 이어가는 김길윤(76·대구시 지산 1동) 할머니 가족 얘기다.
시작은 6·25전쟁 직후인 1954년, 김 할머니의 어머니인 고(故) 박차은 할머니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살던 가족이 막 대구에 자리 잡았을 무렵이었다. 남편은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었고, 박 할머니가 헌 옷을 구해 돌아다니며 파는 보따리 장사를 해 생계를 꾸렸다. 그러다 집 근처에서 흙을 먹는 고아를 봤다. 넉넉지 않은 처지였지만 “저런 사람들 돕자”고 가족들을 설득했다. 쌀·옥수수죽을 쑤어 고아·노인들과 나눴다. 당시 10대였던 딸 김길윤 할머니는 “내가 배가 고파도 더 힘든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그때 자연스레 몸에 배게 됐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자라 제약회사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며 반찬값을 아끼고 생활비를 쪼갰다. 장모(박 할머니)가 어떤지를 아는 남편도 흔쾌히 찬성했다. 모은 돈으로 집 근처 초등학교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처음 건넨 게 70년대의 일이었다. 남편 월급이 늘면서 장애인 학생들까지로 장학금 대상 또한 덩달아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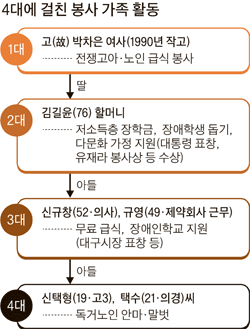
김 할머니의 두 아들 신규창(52·의사)·규영(49·제약회사 근무)씨 역시 ‘나눔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규창씨는 “어려서부터 하도 봐서인지 이웃과 나누는 걸 생각하게 됐다”며 “우리 가족의 후천성 DNA인 셈”이라고 말했다. 두 형제는 장애인 학교에 매년 기부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자신들이 돈을 내어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식봉사를 한다. 김 할머니는 “굳이 내는 돈 셈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두 형제가 이리저리 기부하는 게 한 해 수천만원은 족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몇 년 전부터는 김 할머니의 손자, 그러니까 두 형제의 아들들이 동참하기 시작했다. 의경 복무 중인 신택수(22)씨와 곧 고교를 졸업하는 택형(19)군이다. 때때로 봉사활동 가는 김 할머니 등에 업혀 나눔이 무엇인지를 보고 자랐다. 그러더니 둘 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동네 홀로 사는 노인과 결연을 맺고 수시로 찾아 안마를 하고, 말벗이 됐다. 용돈을 아껴 과자·사탕을 사 간다.
김 할머니와 아들, 손자 3대의 나눔은 계속 현재진행형이다. 할머니는 동네 할머니·아주머니들과 도시락 120개를 만들어 매일 점심 때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돌린다. 돈을 대는 건 두 아들이다. 가족 생일이면 잔치를 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음식을 나눈다. 그래서 김 할머니 가족은 생일은커녕 환갑이나 칠순 잔치조차 한 적이 없다.
이런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조용히 퍼져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김 할머니 가족을 ‘적십자 봉사 명문가’로 선정했다. 지난해 말에는 국민 추천을 받아 상을 주는 ‘국민추천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 15일 지산1동 보성아파트에서 김 할머니 자택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할머니는 연신 시계를 보더니 오후 1시가 되자 나가야 한다고 일어섰다. 120개 도시락을 돌릴 때가 살짝 지난 것이었다. 일어서는 김 할머니에게 왜 봉사를 하는지, 혹시 소원은 있는지 물었다. 김 할머니는 답했다. “나눈다는 게 자꾸 하면 그냥 즐거워져. 소원이라면…, 나누며 사는 게 손주들의 아이들, 또 그 아이들, 이렇게 5대, 6대, 7대까지 계속됐으면 해.”
대구=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