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강일구]
[일러스트=강일구]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의 모양과 기능을 놓고 여러 나라의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가 내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합니다. 대체로 보면 애플은 “삼성이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하고, 삼성은 “애플이 우리의 표준 특허를 도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준특허’란 뭔가요.
옛날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여러 나라를 한데 합쳐놓으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되’니 ‘한 말’이니 하는 양이 지역마다 달라서입니다. ○○지역 사람이 예전엔 가지 않던 지역을 여행하다가 곡식 한 되를 샀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터무니없이 양이 적다든가 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지요. 이에 진시황은 부피와 무게·길이를 하나로 똑같이 맞추도록 했습니다. 이런 게 ‘표준특허’에서 말하는 ‘표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하나로 맞춰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지요.
표준이란 부피나 무게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기술에도 표준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했다지만 뭐니 뭐니 해도 휴대전화의 기본 기능은 목소리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만드는 업체마다 목소리를 송신·수신하는 기술 방식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A전자회사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이 B회사 제품을 쓰는 친구와 통화하는 게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은 더더욱 어렵고요.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여러 기업이 똑같은 한 가지 기술을 써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술표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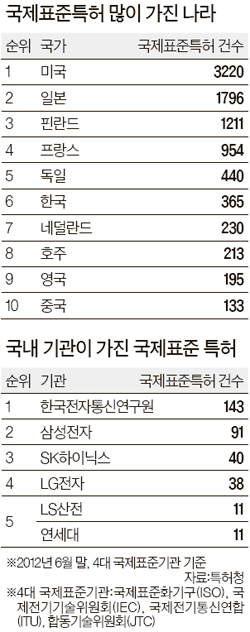
전 세계 기업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기술표준은 누가 정할까요. 공인된 국제기구가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3대 국제표준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입니다. IEC는 전기·전자 쪽을 주로 다루고, ITU는 통신기술을 관장합니다. ISO는 나머지 대부분 분야의 기술표준을 제정합니다. 이 세 곳 말고 정보기술(IT) 표준 제정을 맡은 합동기술위원회(JTC)란 곳이 또 있습니다. ISO와 IEC가 함께 만든 위원회입니다. 앞의 세 곳에 JTC까지 합쳐 ‘4대 국제표준기관’이라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 말고도 유럽정보통신표준화기구(ETSI) 등 많은 표준 제정 국제 기관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개발해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이 국제표준이 되면, 이 회사는 ‘우리가 관련 특허를 갖고 있다’고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신고한 특허가 바로 ‘표준특허’입니다.
여기까지 읽은 틴틴 독자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와, 표준특허를 가진 기업은 ‘대박’ 치겠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기술을 전 세계 기업들이 쓸 테고, 그러면 수많은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특허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수입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됩니다. 국제표준기구들은 특정 기업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특허를 세계 표준으로 정하는 대신, 지나치게 많은 특허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쓸 보편적인 기술인데, 과도한 특허료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제한이 있음에도 기업들은 표준특허가 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우리 기술이 으뜸으로 인정받아 세계 표준이 됐다’는 영예를 얻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표준특허가 되면 그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또 다른 기술까지 전 세계인이 쓰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꼭 들어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PC 사용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운영체제를 많이 쓰면 MS가 개발한 MS워드나 엑셀 같은 프로그램도 덩달아 많이 쓰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결국 한 기업의 기술이 표준이 되면, 그 기업이 가진 또 다른 기술까지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보유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앞서 말한 ‘4대 국제표준기관’이 선정한 표준특허 기준으로 3220개를 갖고 있습니다. 대략 표준특허 3개 가운데 하나가 미국 소유입니다. 우리나라는 365개로 세계 6위에 올라 있습니다.
박태희 기자



![[단독]만취 도주 롤스로이스男, 김태촌 뒤이은 범서방파 두목이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0bba3085-37bb-42a8-959c-5549e4e668a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