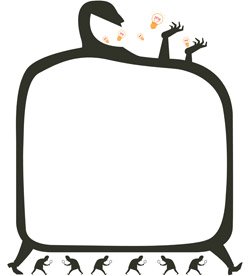
마크 저커버그 미국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상장 한 달 전인 올 4월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아메리카온라인(AOL)에서 사들인 특허 650건을 인수했다. 거금 5억5000만 달러(약 6215억원)를 쏟아부었다. 상장을 앞두고 기업 가치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그땐 이미 상장을 위한 기업가치 평가가 끝난 상황이었다.
그것은 저커버그의 방어작전이었다. 저커버그는 당시 “이번 특허 인수가 장기적으로 페이스북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격자는 누구였을까. 바로 야후였다. 페이스북의 등장으로 더욱 위태로워진 야후가 올 3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저커버그는 야후 등이 그 특허를 사들여 자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선수 친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요즘 글로벌 IT기업, 특히 스마트폰 관련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특허를 사들이는 게 붐을 이루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애플·인텔·MS·구글 등 메이저 IT 기업들이 특허매입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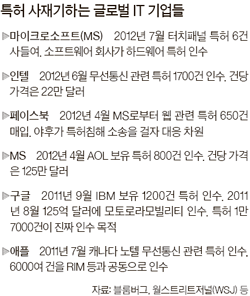
가장 공격적으로 특허를 사들이고 있는 곳은 구글이다. 창업자 겸 CEO인 래리 페이지는 지난해 8월 이동전화 제조회사인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인수(M&A)했다. 125억 달러(약 14조1250억원)를 들인 빅딜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당시 전문가들이 ‘서비스회사인 구글이 마침내 이동전화 제조회사까지 장악했다’고 평가했지만, 페이지의 진짜 관심 사항은 모토로라가 보유한 특허였다”고 보도했다.
실제 모토로라가 보유한 특허는 1만7000건에 달했다. 거의 모두가 스마트폰 서비스와 직결된 것들이다. 페이지는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에도 IBM과 특허 빅딜을 벌였다. 특허 1200건을 일괄 인수했다.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MS는 올 7월 터치패드 관련 특허 6건을 사들였다. 또 4월엔 AOL이 보유한 특허를 샀다. 이 가운데 일부를 페이스북에 되팔아 “매입 대금 절반을 회수했다”고 MS는 밝혔다.
특허 인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정면 대결도 다반사로 빚어졌다. 지난해 7월 캐나다 통신기계회사인 노텔의 특허를 놓고 애플과 구글이 한판 싸움을 벌였다. 승리는 애플의 몫이었다. 그 바람에 ‘특허군비(Patent Arsenal) 경쟁’이란 말이 만들어졌다.
미 실리콘밸리 전문가들은 IT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만 특허군비 경쟁을 벌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빈번하게 제기되는 특허소송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IT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방어적 특허매입(Defensive Patent Aggregation)’이라는 얘기다. 실제 구글 쪽은 특허매입에 대해 “경쟁 회사의 적대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 시작된 특허전쟁이 초래한 현상인 셈이다.
그 바람에 고가에 사들인 특허가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는 경우는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다. 마치 냉전시대 핵무기처럼 막대한 자원이 비상대기 상태로 무기고에 쌓여 있는 셈이다. 또 보유한 특허를 바탕으로 경쟁회사를 상대로 빈번하게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 또한 회사 자원의 낭비다. 브라이언 러브 미 샌타클래라대(법학) 교수는 최근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혁신은 법정다툼이 아닌 경쟁에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방어적 특허매입 기업이 경쟁회사의 특허소송이나 제품개발 등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벌이는 특허매입. 목적이 견제이다 보니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제품화 가능성이 낮은 특허까지 사들인다. 그 바람에 기업의 자원이 낭비되기 일쑤다. 반대가 ‘공격적 특허매입(offensive patent aggregation)’이다. 특허를 활용해 로열티를 챙기는 게 주된 목적이다.


![[오늘의 운세] 4월 2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