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는 요즘이다. 경기가 가라앉아서다. 회복 신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 음식점·소매·부동산중개업소엔 손님들 발길이 끊기고 전화벨 소리마저 잠잠해졌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들이 그런 건 아니다. 불황을 남의 나라 얘기처럼 여기는 자영업자들이 있다. 손님이 줄기는커녕 나날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음식점과 서비스 자영업자, 그리고 프랜차이즈 점주를 만나봤다. 그들이 각각 내세운 비결은 이런 것이었다. ‘정성이야말로 최고의 경쟁력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라’ ‘지금 잘 되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잘 될 사업을 골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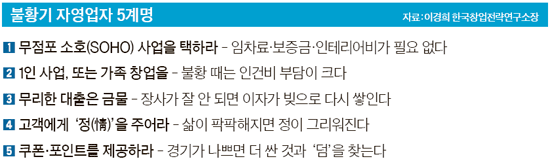
고객 불만 콜 3번 넘은 거래처 삼진 아웃
배달음식 콜센터 운영 조민제씨
 ‘배달음식점 콜센터’란 이색 사업을 하는 조민제(43)씨가 부산시 거제동의 한 식당 업주에게 안내 책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부산=송봉근 기자]
‘배달음식점 콜센터’란 이색 사업을 하는 조민제(43)씨가 부산시 거제동의 한 식당 업주에게 안내 책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부산=송봉근 기자]“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자신이 고객에게 남다른 뭔가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인터넷 설치 대리점을 운영하던 조민제(43)씨는 지난해 초 부산·경남 지역에서 ‘다모아플러스’라는 배달음식 콜센터를 차렸다. 스스로 생각한 아이디어 사업이다. 동네 음식점 광고를 실은 책자를 만들어 집집마다 돌린 뒤, 고객이 광고를 보고 주문을 하면 그 내용을 콜센터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놨다.
그러곤 주문 금액에 따라 음식점으로부터 건당 600~2500원을 받는다. 광고 효과가 직접 나타날 때마다 음식점들이 광고비를 조금씩 내는 셈이다.
조씨는 동네 음식점들이 생활정보지 같은 데 광고를 하면서도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한다는 데 착안해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 스스로 생각해 낸 ‘남다른’ 서비스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한동안 괜찮은 듯했으나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소비자들이 외식 주문을 잘 하지 않게 되자 사업이 어려워졌다. 처음엔 콜센터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주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는 데 돈을 들이기까지 했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더군요. 음식점 말고 또 다른 고객인 소비자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저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조씨는 또 다른 서비스를 궁리했다. 다모아플러스를 통해 주문을 하면 나중에 음식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줬다. 고객 불만 관리센터도 따로 뒀다.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전화가 세 번 걸려온 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했다.
그러자 다시 매출이 늘기 시작했다. 최근엔 월 3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 조씨는 “호황이라고까지 할 수야 없겠지만, 남들보다 불황을 훨씬 덜 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이렇게 덧붙였다.
너도나도 뛰어드는 음식점은 레드 오션
실내 공기 관리사업 개척 이기현씨
 이기현(54)씨는 11년 전인 2001년 미래 수요를 내다보고 실내 공기·냄새 관리 체인을 차렸다. 지금은 가맹점만 120개에 이른다. [변선구 기자]
이기현(54)씨는 11년 전인 2001년 미래 수요를 내다보고 실내 공기·냄새 관리 체인을 차렸다. 지금은 가맹점만 120개에 이른다. [변선구 기자]이기현(54)씨는 애초 건설회사에 다니며 음식점 창업을 꿈꿨다. 종종 식당 주인들과 술을 마시며 어려움은 무엇인지 물었다. 일을 배우려고 휴가 때 유명 식당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주일 동안 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사장님들’의 얘기는 한결같았다. “수입은 들쭉날쭉하고, 신경 쓸 것은 많고, 식당을 왜 하려고 합니까.”
그러던 차에 미국 출장을 가게 됐다. 우연히 들른 GE 매장에서 상쾌한 향기가 났다. 직원에게 무슨 향기냐고 물었다. “실내 공기를 전문으로 관리해 주는 업체에서 서비스한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씨는 “음식점이 전부가 아니란 생각이 퍼뜩 들더라”며 “한국이 더 잘살게 되면 이런 웰빙 아이템이 뜨겠구나 싶었다”고 했다. ‘미래’를 보고 사업을 선택한 것이다.
그길로 한국에 돌아와 비슷한 업체가 있는지 찾아봤다. 몇 년 전 한 업체가 뉴질랜드의 실내 공기 관리 업체에서 관련 용품을 수입하다 문을 닫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길로 뉴질랜드에 달려가 독점 수입 계약을 했다.
2000년 10월 그렇게 시작한 게 ‘에코미스트’다. 사무실·매장·가정을 방문해 세균을 소독하고, 향수를 뿌리는 등 실내 공기를 관리해 주는 업체다. 자본금 5000만원, 직원 두 명으로 시작했다.
처음엔 쉽지 않았다. 국내엔 생소한 것이어서 누구도 선뜻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이씨는 직접 낮에 미용실·병원·사무실을, 밤엔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영업했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는 업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무료 제공을 뚝 끊었다. 그러자 주문 전화가 걸려왔다. 주문을 내는 업소들은 “향기가 없어졌다고 고객들이 불평한다”고 했다. 서비스에 젖어 없으면 불편을 느끼도록 한 마케팅이 성공한 것이었다.
에코미스트의 지난해 매출은 30억원. 이젠 가맹점 120곳을 거느린 중소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이씨는 “남들 다 하는 아이템은 창업하기 쉽다는 얘기지만, 그만큼 쓰러지기도 쉽다는 것”이라며 “불황일수록 미래를 내다본 ‘블루 오션’ 아이템을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곱창집 차렸다 날린 1억은 ‘성공 수업료’
‘우동 대박’ 성공 신화 쓴 민현택씨
 부산의 사누키 우동 전문점 ‘다케다야’에서 주인 민현택(43)씨가 직접 만든 면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3년간 면발 만드는 기술을 익힌 뒤 가게를 냈다. 그는 “음식점은 정성이 곧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부산=송봉근 기자]
부산의 사누키 우동 전문점 ‘다케다야’에서 주인 민현택(43)씨가 직접 만든 면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3년간 면발 만드는 기술을 익힌 뒤 가게를 냈다. 그는 “음식점은 정성이 곧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부산=송봉근 기자]“음식점,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도 정성, 둘도 정성. 창업 준비를 할 때부터 지극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부산시 남천동에서 우동집 ‘다케다야’를 운영하는 민현택(43)씨.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던 그는 2006년 회사를 그만두고 경기도 분당에 곱창구이집을 차렸다. 500만원을 주고 한 달간 부산의 양곱창집에서 조리기술을 배우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창업. 자신은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맛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퇴직금과 모아놓은 돈 1억5000만원을 1년 만에 날리고 문을 닫았다.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억이 나더군요. 영업사원 시절 접대 식사차 종종 가던 한 호텔의 기막힌 우동맛이요. 수프나 간장 없이 밀가루·소금·물만 갖고 반죽해 면 자체의 쫄깃함을 살린 사누키 우동이었습니다. 그걸 해보자고 마음먹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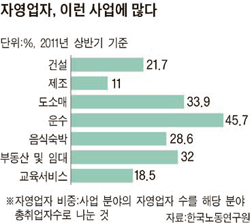
호텔을 찾아갔더니 우동을 만들던 일본인 요리사는 은퇴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하지만 우동에 반했던 민씨는 일본인 요리사와 친하게 지내면서 일본 내 연락처까지 알아뒀던 터. 국내 학원에서 한 달 배운 일본어 실력만 믿고 2007년 무작정 일본으로 향했다. 일본인 요리사는 “나는 은퇴했다”며 다른 우동집 주인을 소개해 줬다.
처음엔 물을 끓이고 청소하는 허드렛일만 했다. 6개월이 지나자 우동 스승이 주방일을 허락했다. 스승은 “6개월간 궂은일만 시킨 건 우동에 대한 열정을 확인하려던 것”이라고 했다. 그 뒤 2년6개월간 쫄깃한 우동 면발 만드는 법을 익히고 또 익혔다. 3년이 되자 스승이 말했다. “그 정도면 한국에서 사업을 해도 된다.” 그리고 명심하라며 일러준 한마디. “잔기술은 정성을 이기지 못한다.”
지난해 7월 차린 우동집은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달 월 매출 9000만원을 기록했다. 민씨는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음식점을 만들려면 준비 과정부터 ‘독기’에 가까운 정성이 필요하다”며 “외식업 창업 후 3년 안에 50%가 문을 닫는 것은 정성 들여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권혁주·김기환·심서현·채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