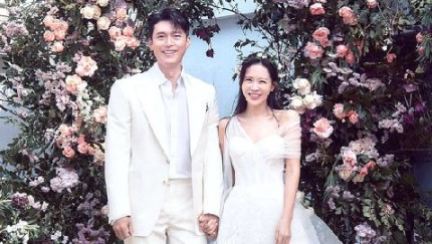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대변인을 통해 은행인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가 하면 금융계 내부에서도 여전한 '관치 (官治) 인사' 라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은행인사는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절대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비서실과 당에 지시한 뒤의 일이라 국민들은 이같은 불만에 대해 어리둥절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서울은행 임원선임의 경우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임한 인사를 막판에 재정경제원이 바꿨다고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형식논리로 보면 제1 대주주인 정부가 주주권 행사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관치' 를 벗어나 은행자율을 새로운 은행경영원리로 삼자는 대세와는 맞지 않는다.
박지원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부실은행 은행장들의 유임이 문제있다고 제기하면서 "앞으로 새 정부는 인사불개입을 통해 은행의 책임경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겠으나 경영진이 경영에 대해 책임지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왜 朴대변인이 유독 행장인사만 문제삼았는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으나 은행의 책임경영은 현재와 같은 애매모호한 경영주체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인식했어야 했다.
우리는 이번 은행인사 해프닝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오래된 관치인사의 전통에 있다고 본다.
아무리 대통령이 인사불개입을 천명해도 은행 내부에서 힘있는 곳에 청탁을 하러 다니고 결국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게 돼 있다.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이제까지 개입해 왔던 힘이 잠시 물러난 틈새에 다른 권력이 새들어 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될 비정상적인 은행인사를 원천적으로 막고 책임경영 풍토를 확립시키려면 경영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하고 그 근본은 주주다.
아무리 사외이사를 강화하고, 심지어 외국인이나 전문가 영입의 길을 열어도 경영주체가 분명치 않으면 자율인사가 불가능하고 나중에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
누차에 걸쳐 본란에서 주장해온 대로 만일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하는 것이 염려스럽다면 적절한 대출제한 규정을 마련해 해결할 일이다.
외국인에게까지 개방한 소유상한을 국내기업에 막을 명분도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