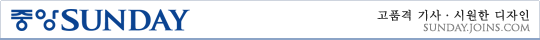아버지가 야구 감독을 하면서 처음 눈물을 흘린 날이다. 아버지는 흙과 땀, 그리고 눈물이 범벅 된 유니폼을 입고 스파이크까지 신은 채 동대문운동장에서 집까지 걸어왔다. 마지막 남은 힘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그대로 픽 쓰러졌다.
좌절한 아버지 곁으로 7살 난 아들이 다가왔다. 한 시간이 넘도록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아버지를 서서 바라보기만 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김성근(65) SK 와이번스 감독이 회상한 1977년 어느 날이다. 그가 이끌던 충암고는 황금사자기 8강전에서 9회말 1사까지 2-0으로 앞서다가 역전 끝내기 3점홈런을 얻어맞고 패퇴했다. 기세봉이 노히트노런 피칭을 했던 터였다. 선수들은 대성통곡을 했다. 제자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치자 독하디독한 김 감독도 눈물을 쏟았다.
30년 전의 어느 날
그로부터 30년이 흘러 2007년 가을. 페넌트레이스 1위를 차지한 SK는 두산 베어스와의 한국시리즈에서 1, 2차전을 모두 내줬다. 이전 24차례 한국시리즈에서 초반 2연패를 당하고 역전 우승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김 감독은 승부처였던 2차전에서 진 뒤 송태일 매니저에게 “이대로 4연패로 진다면 감독을 그만두겠다”며 그답지 않게 약한 소리도 했다.
패배의 그림자가 너무 짙었다. 김 감독은 새벽 2시가 되도록 문학구장을 떠나지 못했다. 반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용기도 나지 않았다. 다리가 풀려 감독실 소파에 드러누웠다. 이때도 유니폼을 입은 채였다.
똑똑. 문이 열렸다. 김정준 SK 전력분석팀장, 김 감독의 아들이었다. 아들은 마치 30년 전처럼 아버지 곁을 말없이 지키고 있었다. 한참 후 정적이 깨졌다. “가라.” “네, 저 갑니다.” “야속한 놈.”
겨우 몸을 일으킨 아버지는 인천 송도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와 있었다. ‘장수가 약해지면 병사들은 쓰러집니다. 힘내세요.’
김 감독은 “아들 뒷모습을 보니 까맣게 잊고 있었던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더라. 그때처럼 난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다”고 회고했다. 77년 충암고는 다음 대회인 봉황대기에서 기어코 우승을 차지했다. SK는 2007년 한국시리즈에서 3~6차전을 쓸어 담으며 창단 후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아들, 아버지를 따르다
아버지에게는 야구가 전부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야구를 시켰다. 60년대를 호령했던 왼손투수의 아들은 오른손잡이 내야수였다. 아들은 아버지의 한이 서려 있는 충암고를 거쳐 연세대에 진학했다. 92년 2차 9순위 지명 선수로 LG에 입단했다.
아들은 그해 1군에서 5경기만 뛰고 은퇴했다. 14타수 2안타(타율 0.143)가 그가 남긴 프로 기록의 전부다. 다들 “아버지의 그림자가 너무 크다. 아들이 아버지를 넘기란 역시 힘들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아들의 야구인생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는 93년부터 LG의 전력분석팀에서 일했다. 당시만 해도 전력분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다. LG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 전력을 데이터화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을 활용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야구를 보는 눈과 이를 분석하는 두뇌를 물려받았다. 동작을 보는 눈썰미,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이터를 갖춰놓은 그는 일본 주니치 드래건스로 연수를 다녀온 뒤로 한국야구 전력분석의 1인자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아들이 ‘김성근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벗은 시점이 이때다.
아들이 LG 직원으로 일할 때 아버지는 삼성·쌍방울 감독이었다. 상대 감독과 분석원의 신분으로 서로의 약점을 봐야 했던 처지였다.
김 감독이 2001년 LG 지휘봉을 잡자 자연스럽게 부자상봉이 이뤄졌다. 하위권을 전전하던 LG는 2002년 한국시리즈에 올랐다. 앞에서 아버지가 끌고, 뒤에서 아들이 밀었다.
아버지, 아들에게 배우다
LG는 전력 열세를 딛고 한국시리즈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치열하게 싸웠다. 승부 흐름이 LG로 넘어가는 순간, 6차전 9회 말에 삼성 이승엽의 동점 3점홈런, 마해영의 역전 결승홈런이 터졌다. 김 감독이 77년 황금사자기 이후 가장 아쉬워했던 준우승이었다.
시리즈가 끝나자 LG는 김 감독을 해임했다. 성적 부진이 아닌 구단과의 마찰 때문이다. 김 감독은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는데 감독을 내치는 것은 야구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를 갈았고, 아들도 곧 보따리를 싸고 SK로 떠났다.
아버지와 아들은 5년 뒤 재회했다. 부자는 이미 서로의 분야에서 정상에 서 있었다. ‘야구의 신’으로까지 칭송받는 김 감독은 야구 얘기를 하면 누구에게도 물러서지 않는다. 아버지에게 유일하게 쓴소리를 하는 이가 아들이다.
김 감독은 아들에게서 조언을 받았다. 수도 없이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라는 문자메시지가 날아들었다. 예전 같으면 콧방귀를 뀌고 말았을 테지만 이젠 아버지도 아들도 많이 변했다.
김 팀장은 한국시리즈에서 두 경기를 내주고 무너져 있던 김 감독을 일으켰다. 마흔이 다 된 아들은 이튿날 머리카락을 빡빡 밀어버렸다. 역전 우승을 차지하고 처음으로 아버지와 얼싸안은 아들의 입술은 심하게 부르터 있었다.
김 감독이 말했다. “내가 정준이 나이 때 야구가 안 돼서 삭발한 적이 있어. 그때 생각이 나더군.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닮아가나 봐.”
김식 JES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