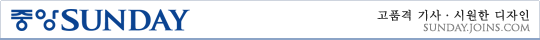조선후기 『청대일기(淸臺日記)』의 저자이며 학자관료였던 권상일(1679~1759)은 세 번 혼인했다. 세 명의 부인을 얻었으니 권상일은 흔히 말하는 대로 ‘화장실 가서 웃었을까?’
첫 번째 부인의 사망 원인은 구토 증세였다. 권상일과 부인은 임신이려니 하고 있었는데, 증세가 갑자기 심해지더니 결국 죽게 됐다. 당시 첫 부인은 28살이었다. 아들을 하나 낳은 적이 있지만 세 살 때 잃었다. 이 부부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끝내 혈육이 없었다. 권상일은 일기에서 부인에 대한 기억을 길고 애틋하게 술회한다. 그러나 그는 부인이 죽은 지 9개월 만에 재혼한다. 할머니가 빨리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서둘렀기 때문이다. 권상일은 달갑지 않아 하는 모습이 역력한 기록을 남긴다.
본래 조선 『경국대전』에서는 ‘사대부는 처가 죽은 후 3년 뒤라야 다시 장가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부모의 명이 있거나 혹은 나이가 40이 넘도록 아들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일 년 뒤에 장가들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 3년 후로 정한 까닭은 대개 삼년상은 치러야 한다는 정리에서 나온 듯하다. 과부재가금지에 비하면 경미하지만, 남자들에게도 재혼에 대한 제한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1706년 12월 권상일은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다. 그런데 이 부인도 아들 만아
를 낳고 2년 만에 병으로 죽는다. 권상일의 표현에 따르면 부인의 배가 차갑고, 또 배 속에 뭔가 덩어리가 만져졌다고 했다. 아마도 이것은 오늘날의 ‘자궁근종’이 아닐까 한다. ‘자궁근종’은 지금은 대단한 병이 아니지만, 전근대 시기에는 죽음에도 이르게 하는 병이었다. 이 시기 여자들이 일찍 죽는 이유는 상당 부분 출산과 관련이 있었다. 전에 얘기한 바 있는 노상추(盧尙樞)는 첩 석벽이 출산 직전 유종(乳腫)으로 고생할 때 매일매일 상태를 점검하며 노심초사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유종이 낫지 않자 노상추는 산모는 친정에 두고 아이만 데려와 유모를 두어 젖을 먹일 정도로 신경을 썼다. 산전산후증은 조선시대 여자들의 죽음, 그리고 연이은 남자들의 재혼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1712년 두 번째 부인을 잃었을 때 권상일은 34살이었다. 양반 남자가 혼자 살기에는 애매한 나이였다. 더구나 권상일에게는 두 돌 된 아들이 있었다. 삼혼(三婚)이 불가피했다. 일기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언제 다시 혼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715년 어간으로 보인다. 이때는 재혼만큼 서두른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1720년 그는 또 세 번째 부인의 첫 기제사(忌祭祀)를 지내고 있다. 세 번째 부인마저 4~5년 만에 죽은 것이다. 권상일은 세 번 혼인하고 세 번 부인을 잃었다. 이제 그는 40대 초반이 됐고 10살, 4살 된 두 아들이 있었다.
권상일의 이때 심정은 어땠을까. ‘어린 아들이 있으니 여자의 손길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다시 혼인을 해야 하나?’ 생각해보라. 사당에 한 남자 부인의 신주가 네 개나 들어가는 장면을. 이제까지 여러 기록을 봤지만, 양반 남자가 네 번 정식 혼인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 역시 민망한 일로 여겼던 모양이다. 권상일은 결국 소실(小室)을 들였다. 소실을 들일 때의 기록은 아주 짧다. 첩에 대해 길게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심정이 읽힌다. 훗날 권상일은 혼인과 관련한 자신의 일들을 ‘재앙’이라고 표현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은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다. 상대를 선택하고 내가 또 선택되어야 하고.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이 과연 즐겁기만 할까. 전 부인에 대한 감정이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웃어른들이 혼인을 서두르는 것은 또 본인에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었겠는가. 어쩌면 이것은 남자들에게 하나의 제약이었는지도 모른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경우가 있으니 말이다. 조선시대 양반 남자들에게 재혼은 반드시 즐거운 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이순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